

SPECIAL FEATURE Ⅰ
로우테크놀로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함수관계를 넘어서_ 여경환
SPECIAL FEATURE Ⅱ
아날로그 노스탤지어, 포스트-디지털의 멋진 신세계_ 유원준
SPECIAL FEATURE Ⅲ-Ⅰ
감성의 아날로그, 잃어버린 아날로그시계의 시침_ 최형우
SPECIAL FEATURE Ⅲ-Ⅱ
방식의 아날로그, 다시 등장하는 아날로그시계의 태엽_ 최형우
앤 해밀턴(Ann Hamilton) <The Event of Thread>
2012 파크 애비뉴 아모리 커미션 설치전경
사진: 제임스 어윙(James Ewing)
Special feature Ⅰ
로우테크놀로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함수관계를 넘어서
● 여경환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기술의 본질이 전혀 기술적인 것이 아니기에, 기술에 대한 본질적인 자각과 기술과의 결정적 대결은, 한편으로는 기술의 본질과 가깝게 관련되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과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어떤 영역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영역이 곧 예술이다.” -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
1937년, 마르틴 하이데거는 당대를 대표하는 철학자로서 현대 과학기술의 위협에 직면하여 「기술에 대한 논구」를 발표했다. 20세기 초, 가공할만한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목도하면서 그는 철학자가 해야 할 일이 형이상학적 관념을 사유하는 것에 머무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는 이러한 테크놀로지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시도하는 일이었을 것이다. 하이데거에게 존재는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살아가는 특정한 역사적 시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 대한 이해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 전반을 겪어내면서 닦달을 강요당하는 현대 사회 속에 놓인 인간의 상태,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자들이 자신의 고유한 존재를 상실하고 한갓 계산 가능하고 처분 가능한 에너지 집합체로 전락한 시대, 그리고 모든 존재자들의 고유한 존재와 무게가 상실된 상태에 대한 하이데거의 비판적 인식은 그에 대해 기술결정론자라는 폄하된 평가를 낳기는 하지만, 기술의 힘을 누구보다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할 것인가를 고심했던 철학자로 재평가되고 있다. 하이데거는 기술에 대한 도구적 규정을 넘어서 ‘기술에 대한 본질적인 자각’, 즉 기술의 본질에 다가가기 위한 방법으로 기술을 인식을 해명하여 열어젖히는 탈은폐로서의 기술, 그리고 테크네(techne)로서의 기술을 강조했다.
카스텐 휠러(Carsten Höller) 함부르거 반호프 soma
설치전경 사진: 아틸리오 마란자노(Attilio Maranzano)
Courtesy ⓒ VG Bild Kunst, Bonn
고대 그리스의 테크네는 테크닉(기술)과 아스(예술)이라는 두 단어로 분리되기 전까지 하나의 어원을 갖는데 수공적인 기술의 의미뿐만 아니라 포이에시스(Poiesis)의 의미, 그리고 인식을 해명하며 열어젖히는 탈은폐의 힘까지 들어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때 테크네는 앎을 뜻하는 에피스테메(episteme)의 의미를 포괄한다. 그런 하이데거에게 예술이라는 영역은 현대 사회와 현대 기술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탈은폐’의 가능성을 제시해주는 하나의 대안적 가능성, ‘기술과의 결정적 대결’을 할 수 있는 영역, 그것을 예술이라고 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2015년,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전히 예술이 탈은폐의 힘을 가진, 기술의 대안적 가능성일 수 있다는 이 하이데거의 전망에 동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하이데거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기술이 목적을 위한 수단이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삶의 방식, 인간관계 자체를 변형시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예술은 과연 기술, 즉 테크놀로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것의 맹점을 폭로하고 보완해내는 역할을 해왔을까, 특히 디지털 테크놀로지나 인터넷과 연결된 갖가지 융복합 미디어와의 결합들 속에서 예술은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물론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면서 미술은 변해왔다.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문제는 단순히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문제만은 아니다. 테크놀로지는 첨단의 과학기술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물감과 염료 기술의 발전으로 회화 기법이 발전해 왔고, 기술복제시대가 낳은 사진과 영화는 필연적으로 미술의 방향을 미술이라는 매체 자체에 대한 탐구의 여정으로 바꾸어냈다.
0과 1이라는 디지트에 의해 비물질화되고 융합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미술을 ‘데이터와 알고리듬에 기반을 둔 데이터의 변형’이라는 전혀 새로운 조건을 형성해 놓았다. 물론 그러한 수많은 갈래의 변화양상들을 단순화하기 어렵고, 미술의 변화가 단지 기술이라는 요인만으로 추동되지도 않는다. 하지만 그 모든 미술 자체 변화의 흐름에 테크놀로지는 그 배경과 조건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시각이라는 감각을 기반으로 예술의 한 장르로서 미술이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각화(visualization)라는 과정 속에 내재된 테크놀로지는 단지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테크놀로지와 결합하느냐는 매체를 결정하고 매체에 따라 미술의 양식, 나아가 주제까지 영향을 받게 된다. 19세기 초 사진이라는 매체의 보편화로 인해 전통 회화의 대상과 주제가 3차원 원근법 공간의 재현에서 벗어나 회화의 평면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변화를 촉발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산업혁명 이후 대량과 기계화된 사회로의 변모, 대도시 공간이라는 새로운 삶의 조건,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매스 미디어 환경이 가져온 변화는 미술에 있어서 회화 이외의 다양한 테크놀로지들과의 결합을 요구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기계 장치가 만들어내는 움직임, 빛, 소리의 작동을 보여주는 키네틱 아트이다.
최종하 <PM-1b> 2010 혼합매체 250×105×220cm
마르셀 뒤샹(Marcel Duchamp)의 <모빌>(1913), 나움 가보(Naum Gabo)의 <키네틱 조각>(1922), 라즐로 모홀리-나기(Laszlo Moholy Nagy)의 <빛-공간조절기>(1930) 등에 기원을 갖으며 특히 움직임을 주요한 모티브로 한다. 주로 바람, 자력, 그리고 관객 자신 등의 에너지의 근원에 집중하는 미래주의·구축주의 흐름과 작품제작에 있어 동작 중인 순수한 형태를 창조하려는 욕망, 또는 풍자나 일시적인 기분을 표현하려는 욕망과 같은 정신을 중시하는 다다·초현실주의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왔다. 키네틱 아트는 1950-60년대 전성기를 맞이한 이후 라이트 아트, 비디오 아트, 미디어 아트, 레이저 아트, 홀로그래피 등의 당시의 첨단 기술을 흡수해갔다. 서구적 흐름과 따로 또 같이 한국 미술계에서 1980년대 이후 나타난 테크놀로지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1980-90년대 한국 테크놀로지 아트의 지형 속에서 작가들은 급격히 산업화된 도시의 소비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해 현대 대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물음, 미술이라는 조형언어에 대한 확장을 추구했다. 당시 한국 테크놀로지 아트는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을 담고 있었다. 첫째는 급격히 산업화된 도시의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 둘째 대도시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 존재에 대한 치열한 물음, 마지막으로 미술의 조형언어에 대한 확장된 탐구였다. 물론 1960-1970년대 한국 테크놀로지 아트의 태동기에서 보여줬던 일련의 아방가르드 미술가들의 작업들로, 김구림과 박현기, 백남준의 작업 외에도 강국진의 네온과 스테인리스를 이용한 작업(1967), 곽훈의 전기, 전자부속품을 사용한 테크놀로지 작업(1970), 재불작가 김순기의 퍼포먼스를 기록한 비디오 작업(1976), 서동화의 모터를 이용한 키네틱 작업(1977) 등을 들 수 있다.
테크놀로지를 비롯한 다양한 매체에 대한 관심과 활용은 타라, 메타복스, 로고스&파토스 등의 소집단 운동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의 모노크롬 회화와 민중미술과의 대립 속에서 택할 수밖에 없었던 ‘제 3의 길’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컬러 TV와 가정용 VCR의 보급(1980년 직후), 무선호출서비스 삐삐와 가정용 컴퓨터, 게임기 등의 보급(1980년대 중반), 가정용 비디오카메라의 보급과 인터넷 통신망 구축(1990년대 초반) 등 특정한 기술의 도입과 발전, 그리고 88서울올림픽, 93 대전 엑스포 등의 개최에 따른 백남준 작품의 본격적인 소개와 같이 보다 사회적이고, 기술적인 이유들에서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히 미술계 내부의 흐름뿐만 아니라 시대적 환경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미술 내부의 약동에 변화를 주는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이러한 흐름에 대한 이해 위에서 우리는 최근 로우테크놀로지의 경향을 제대로 읽어낼 수 있을 것이다. 컴퓨터-휴먼 인터랙션, 사물 인터넷, 일상 속으로 파고든 모바일 디바이스 등 첨단의 디지털 테크놀로지들과 결합한 다양한 예술적 시도들에 대한 일종의 길항작용으로 로우테크놀로지는 첨단의 경향에 대한 대응물로서 인간과 기술의 본질을 탐색하는 회귀의 움직임을 포함할 수밖에 없다.
김태은 <다시 또 다시(Time Loop)>
2014 나무, 플라스틱, 철, 자석, 모터, 아두이노 보드,
스피커, 슬라이드, 환등기 400×470×90cm
그러나 여기의 회귀는 단순한 복고나 향수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로우테크놀로지: 미래로 돌아가다> (2014.12.9-2015.2.1, 서울시립미술관)는 육태진, 문주, 홍성도 등 1990년대 초중반에 시도했던 테크놀로지 작업들과 최근 이예승, 신성환, 양정욱, 정지현 등 젊은 작가들이 선보이는 작업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두 세대 간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최근의 로우테크놀로지 작업의 경향을 한자리에서 보여주는 전시였다. 미술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등장해도 오래된 테크놀로지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테크놀로지는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오래된 테크놀로지를 적극적으로 재매개해 왔다. “어떤 경우에는 장치가 진화하고 변화하는 속도에 맞춰 그 잠재력이 매우 느리게 구현될 수도 있다. 기존 미디어들과 이런 모든 문화적 관계가 가능하다. 불가능한 유일한 것은 전혀 관계를 맺지 않는 것이다”라는 볼터와 그루신의 말처럼 촘촘한 재매개의 네트워크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동하는 운동 속에서 새로운 테크놀로지와 오래된 테크놀로지 사이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재매개(remediation)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셈이다.
예술가들은 이러한 재매개의 테크놀로지 특성을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활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허구성을 폭로하기도 하면서 테크놀로지에 대한 자신의 사유를 펼쳐나간다. 실제로 로우테크놀로지 전시에 참여한 대부분의 작가들의 작품은 수공예적인 일차원적인 기술과 첨단의 테크놀로지들을 경계 없이 결합해서 사용한다. 정지현의 작업은 이러한 젊은 작가들의 경향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그가 <로우테크놀로지>전에서 선보인<Tech Rehersal> (2014)은 연극 공연에서 조명과 같은 기술적인 체크를 요하는 리허설의 한 종류를 가리키는‘테크 리허설’이라는 용어에 착안한 작품이다. 지금까지 발표해 온 자신의 구작(舊作)들이 공연 전의 연극무대처럼 골조가 드러나는 공간 뒤편에 놓이고, 3D 아바타 스킨을 결합한 BJ의 인터넷 방송을 보여주는 신작 <Skin Paster>를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로우테크와 하이테크가 혼재된 경계를 묻는 작품이었다. 최근 이주요와의 협력하여 선보인 설치작업과 퍼포먼스가 결합된 <Dawn Breaks>(2015)도 이러한 확장된 질문들의 연장선 속에서 예술가의 육성과 텍스트라는 이미지, 기억과 움직임과 작동장치들의 시각적 구현들 사이의 문제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엄정순 <코끼리 걷는다-물과 풀이 좋은 곳으로 2>
2013 캔버스에 아크릴릭, 오일스틱 228×720cm
과거와 미래, 로우테크놀로지와 하이테크놀로지, 오래된 매체와 새로운 매체는 서로 모순과 대립이라는 변증법적 관계를 통해 역동적인 지형도를 그려나간다. 서로 내용이 되기도 하고, 형식이 되기도 하면서 오래됨과 새로움의 관계를 끊임없이 되물음으로써 현재를 재정립해간다. 로우테크놀로지 미학은 당대의 미술의 담론 안에서 미술가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매체의 문제가 어떻게 자신이 속해 있는 시대적 조건 안에서 작동하는 가에 대한 사유를 반영한다. 지금, 여기라는 시공간에서 인간의 좌표를 그려보는 철학자처럼 미술가는 테크놀로지가 우리의 삶을 전면으로 압도하는 시대에 갖는 예술적 상상, 미래를 통해 과거로 돌아가고, 과거를 통해 미래와 만나는 그 이상 지대를 그려내 본다. “아아! 옛것을 본받는다는 자는 자취에 얽매이는 것이 병통이 되고, 새 것을 창조한다는 자는 법도에 맞지 않음이 근심이 된다. 진실로 능히 옛것을 본받으면서 변화할 줄 알고, 새 것을 만들면서도 법도에 맞을 수만 있다면 지금의 글이 옛글과 같게 될 것이다-법고이지변(法古而知變), 창신이능전(創新而能典)”이라는 연암 박지원의 길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봐야할 것이다.
글쓴이 여경환은 홍익대 예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대학원 박사과정(영상예술학) 재학 중이며, 월간 아트인컬처 기자, KBS 디지털미술관 방송작가, 경기도미술관 학예연구사를 거쳐 현재 서울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로 재직 중이다. 겨울, 겨울, 겨울, 봄(2012), 생명수업: 세상에게(2014), 로우테크놀로지(2014), 북한프로젝트(2015) 등의 전시를 기획했다.
이서준 <Europa Landing Gear(Drawing)> 2012
Special feature Ⅱ
아날로그 노스탤지어, 포스트-디지털의 멋진 신세계
● 유원준 미술비평
“이 멋진 새로운 세계여!”
디지털 알람 소리에 눈을 뜬다. 오늘은 약간 느낌이 다르다. 어제 장만한 새로운 스마트 시계로 하루를 시작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다소 바쁜 날이 될 듯하다. 벌써부터 상사의 메시지가 휴대폰에서 날 재촉한다. 아마도 해외 바이어에게 지난 밤 급한 메일이라도 온 것 같다. 시간이 아슬아슬하다. 회사로 가는 차 안에서 틈틈이 태블릿을 통해 오늘의 업무를 살펴본다. 실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 덕에 늦지 않게 회사에 도착한 나는 드디어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한다. 네모난 스크린 속에서 회사 동료들과 쌓인 일들을 마주하는 것도 잠시, 난 어느새 화면 하단에 메신저 창들을 띄워놓고 친구들과 주말 약속을 잡고 있다. 점심은 인터넷을 통해 햄버거를 주문했다. 오후 업무를 생각하니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난 까닭이다. 오후에도 바쁜 하루는 계속되었다. 옆 자리의 동료와는 얼굴도 보지 못한 채 메신저를 통해서만 대화를 했을 정도이니. 전 세계의 사람들과 이메일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고 났더니 무언가 세계 여행이라도 다녀온 기분이다. 드디어 퇴근 시간이 되었군. 집으로 가는 길엔 오늘 잠깐 흘려들은 음악이라도 mp3로 들으며 가야겠다. 새로 산 스마트 시계의 배터리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나의 멋진 하루도 끝나가고 있음을 느낀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템페스트(The Tempest)』에서 주인공 미란다는 자신이 12년 동안이나 갇혀있던 섬을 떠나며 위와 같이 외친다. “이 멋진 새로운 세계여!” 그녀가 이제 마주할 문명 세계는 아직까지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멋지고 새로운 것들로 가득찰 것이라는 희망을 품은 채 말이다. 아마도 우리가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처음 마주했던 그 순간의 기대와 희망 또한 미란다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과거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로직과는 매우 다른, 무언가 빠르고 쾌적하며 편리한 새로운 기술에 관한 기대는 매우 강력했다. TV와 영화에서는 디지털이 그리는 신-세계에 관한 유토피아적 예견이 앞 다투어 그려지고 있었고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오브제들을 만날 때마다 기존 세계가 제공해주지 못한 신-기능에 경탄했다. 우리의 삶은 빠른 속도로 0과 1의 이진법 코드로 대체되었으며 디지털의 속성이 시대의 미덕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미란다가 새로운 문명 세계를 경험한 이후에도 그가 처음 외쳤던 ‘멋진 신세계’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었을까. 새로운 기술 문명들이 우리에게 과거와는 다른 편리함을 제공해주었지만, 그것에 도취된 우리들의 모습이 과연 멋진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까.
에브리웨어 <Memoirs> 2010
빈티지 모니터, 폴라로이드 사진기 50×50×150cm
멋지거나 멋지지 않거나. 디지털의 분절
소설가 헉슬리(Aldous Huxley)는 미란다의 위의 외침을 인용해 1932년 자신의 소설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를 발표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소설은 우리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묘사한, 기술-미디어의 의해 발전한 미래의 문명사회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작품이다. 따라서 작품의 제목인 ‘멋진 신세계’ 역시 역설적 의미를 담고 있다. 소설 속의 미래는 감정까지 컨트롤되는, 정밀하게 계산된 유토피아적 세계이지만, 결코 그러한 완벽히 통제되는 유토피아는 디스토피아일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기술은 분명 매우 멋진 경험을 선사해주고 있지만 그러한 경험들이 멋진 삶 자체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며, 앞서 묘사한 일상의 묘사처럼 결국 그러한 기술에 의존하며 자위하는 쳇 바퀴 속의 다람쥐로 우리 스스로를 유비해버릴 수도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쯤 되면, 디지털의 속성이 무엇이건데 이렇듯 우리 삶의 모습을 바꾸어가고 있는지 다시금 곱씹게 된다. 디지털은 이진법 코드로 구성되는 일련의 분절화이다. 모든 정보들을 0과 1의 성분으로 변환하여 체계화하기 때문에 이전의 정보 방식 및 존재 형태와는 다른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본적 성격/성질 덕택에 디지털은 과거 아날로그와 구분되는 특성을 부여받는다. 많은 정보를 짧은 시간에 해석할 수 있으며, 그것을 다시 병렬적으로 재배치 할 수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것들 역시 0과 1의 체계로 귀속되므로 그들 사이의 자유로운 왕복이 가능해졌다. 우리의 미디어가 멀티미디어로 진화하는 근본적 요인이 여기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디지털이 제공하는 기능적 요소들로부터 이전까지의 아날로그가 제공했던 따스한 감정을 전달받지는 못한다. 본질적 요소로부터 구분해보자면, 아날로그가 일련의 연속 및 닮음 구조로 상징되는 어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면, 디지털은 손가락으로 수를 세어보는 행위로부터 파생된 개념이다. 수라는 분절적 의미 단위는 디지털이 지닌 기본적인 의미 구조가 다분히 이성적 차이/구분에 의거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사실, 아날로그가 따스하고 디지털이 차갑다는 느낌은 매우 추상적인 느낌일지 모르지만, 각각이 지닌 의미를 파고들어가다 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또한 디지털이 체계화하는 대상이 아직까지 인공적인 무언가에 머물러 있다는 점 또한 디지털을 생경하게 느끼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아직까지도 디지털은 우리의 신체와 자연을 완벽하게 체계화 하진 못하였다. 그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규정해오고 제한해오던 자연과 신체의 리듬감에 아직까지도 향수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 아날로그의 탈을 쓴 ‘디지-로그(Digi-logue)’ 개념의 등장이 이러한 아날로그에 관한 향수에서 비롯된 것처럼 말이다.
테오 얀센(Theo Jansen) 작
Trialogue: 포스트-디지털의 재분지화
위와 같은 그리움, 특정 향수의 대상으로서 아날로그를 상정하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아날로그는 우리에게 이미 과거를 상징하는 시기적 의미로 규정된다. 사실, 아날로그란 단어 및 개념은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져왔던 매우 기초적이고 자연스러운 개념이지만 그것이 일정 시기 이전의 대표적 개념으로 의미화 된 것은 역설적으로 디지털의 등장 이후이다. 지속적으로 존재해왔던 것들의 급작스러운 형질 변화를 목도하고 있자니, 당연하게도 변화 이전의 것들에 대한 그리움이 생길만도 하다. 그런데, 최근의 이러한 향수는 잃어가는 것들에 관한 막연한 감성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지나간 것을 기억하는 행위가 아닌, 앞으로 도래할 것들에 대한 기대로서의 향수이다. 미래에 다가올 것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문법상의 오류이겠지만, 철학적으로 보자면, 우리에게 도래할 것들은 항상 과거의 어떤 것을 새롭게 현재화하며 탄생한다.
특히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이분법적 구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신선한 도식으로 치부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디지털을 넘어 포스트 디지털의 세계와 현상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술사가인 로잘린드 크라우스(Rosalind Krauss)는 「Reinventing the Medium」이란 글을 통해 포스트 미디엄 시대에서 미디어들에 관한 재조명(재고안)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그는 펠릭스 가타리(Pierre-Felix Guattari)가 언급한 ‘포스트 미디엄(Post-Medium)’이란 용어를 계승하며 그러한 재조명이 앞으로의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또한 그와 융합된 새로운 예술적 상황이 전개될 것임을 예측했는데 그에 따르면 사용자들의 개입을 허용하게 만드는 미디어의 사용으로부터 기술적 지지체로서의 미디어의 본성이 나타난다. 이러한 서술은 매체이론가인 맥루한(Marshall Mcluhan)의 영향력 있는 저서인 『미디어의 이해(Understanding Media)』에서 ‘정세도(정보의 세밀도, Definition)’개념으로도 나타났다.
맥루한은 정보의 양이 많은 미디어를 핫 미디어(Hot Media)로 그 반대의 경우를 쿨 미디어(Cool Media)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정보의 양이 많은 미디어를 우리에게 더욱 유용한 미디어로 인식했던 당시의 상황을 전복시켰다. 『미디어의 이해』의 부제가 ‘인간의 확장(Extension of Man)’임을 떠올려보면 그의 주장이 보다 명확해진다. 이러한 도식을 현재의 상황에 적용해보면, 정보의 세밀도가 매우 높고 치밀한 디지털의 논리는 결국 아날로그가 가진 사용자의 개입 정도에 의해 보완될 수 있다. 최근의 포스트 디지털(미디어)에 관한 논의가 결국 그러한 사용자, 즉 인간 주체와의 융합을 통한 체화(embodiment) 개념으로 진화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원우 <My Shirt is My Shelter>
2014 철, 알루미늄, 천, 페인트 245×380×125cm
이러한 주장은 프랑스의 철학자 질베르트 시몽동(Gilbert Simondon)의 논리와 연결 지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시몽동은 거대 기기화된 기계 문명에서 인간의 역할에 주목한다. 아무리 기계가 자동 기술화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기계는 미결정의 여지를 지니기 때문에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만약, 디지털이 그러한 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분절시키는 기술이라면 아날로그는 자연과 유사한 그것의 닮음 구조를 전제한 연속적인 무언가 이다. 이성을 바탕으로 기계적 도식을 지닌 디지털에서는 불가능한 포스트 디지털의 국면이 사용자와의 자연스러운 연속을 전제한 아날로그의 감성으로 완성될 수 있다. 디지털 기술의 ‘재분지화(re-articulation)’는 이러한 측면에서 시도되어야 한다.
디지털 기술의 특성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한계에 관한 연구는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분절되어 있는 디지털 기술은 오히려 그것이 대응하는 아날로그적 감성과 결합할 때,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날로그를 그리워하는 우리들의 감성은 다분히 미래를 향해 있다. 앞으로 도래할 무언가, 디지털을 넘어선 무언가를 좇으며 우리는 아날로그라는 과거를 현재의 디지털 기술과 융합한다. 이것은 당분간 기업의 상업적 광고 마케팅 용어 속에서, 혹은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 다양한 학술 세미나의 지면에서 빈번하게 등장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환경에서의 변화된 흐름 속에서도 감지할 수 있는 더 이상 특별한 무언가가 아닐지도 모른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포스트 디지털은 새로운 수준에서 삼자대면을 하게 되며, 결국 인간과의 유기적 통합으로 수렴될 것이기 때문이다.
글쓴이 유원준은 미디어아트 에이전시 더 미디엄(THE MEDIUM) 대표이자 미디어문화예술채널 앨리스온(AliceOn) 디렉터다. 현재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디어학부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술미학연구회,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등의 운영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김진희 <April-028> 2014
디지털 피그먼트 프린트에 자수 67×67cm
Special feature Ⅲ-Ⅰ
감성의 아날로그, 잃어버린 아날로그시계의 시침
● 최형우 수습기자
디지털 기술은 시각적, 청각적인 각종 콘텐츠를 0과 1로 바꾸어 놓으면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다. 시간의 흔적이 없는 이 디지털 파일들은 사람 손때가 묻을 리 없고 철저하고 완벽하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모든 것이 죽지 않고 디지털 코드화되어 가고 있는 오늘날의 환경은 흠집이 나고 흔적이 묻는 아날로그가 발견되기 최적화된 시간과 장소가 되기도 한다. 가령 ‘느린 우체통’을 아는가? 2013년도에 첫 선을 보인 이 우체통은 1-2초의 배송시간을 자랑하는 이메일이 세상을 점령하고 있는 오늘날, 반기라도 들듯 ‘느림’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출사표를 던졌다. 참고로 이 우체통의 배달 시간은 1년이다. 이 1년이라는 시간은 신속한 정보 대신 그 날을 기억하는 추억의 감성을 전달해주는 느림의 미학이 된다.
예전 편지와 이메일의 만남은 편지를 몰살시키는가 싶더니 어느 샌가 느림의 잠재력을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했다. 이처럼 디지털을 만난 아날로그는 감성적 의미를 내포한 언어로 탈바꿈한다. 아날로그가 가지고 있는 실체성은 사람들의 정신적 교감을 불러일으키는 메타포로 작동하고 살이 부딪히는 신체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체험의 장을 만든다. 디지털이 주는 효율, 편리, 빠름의 기계화에 상대적으로 아날로그는 더욱 섬세하고 따뜻한 인간 중심적인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의미가 된다. 아날로그의 감성을 파고들기 위해 특정한 사물을 가지고 작업함과 동시에 그 사물과의 감성적 교감을 만들어내는 작가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물론 촉이 곤두서 있는 예술가들은 이전부터 사물에 대한 깊은 성찰을 예술작품에서 일구어 내었다. 일찍이 하이데거는 반 고흐(Van Gogh)의 구두 작업이 ‘구두’라는 존재자(entity)의 존재(Being)를 드러낸다고 하지 않았던가. 고흐의 구두는 더는 도구적 기능을 언급하지 않는다.
구두는 농부의 찌든 삶 냄새가 나는 또 하나의 사람이 되었다. 오늘날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변곡점이라는 구축된 상황, 시대적 특수성과 사회적 담론과 앞서서 언급한 예술작업을 통해 사물의 숨어 있는 가치들을 끄집어내려는 작가 습성과의 만남은 현재 아날로그 사물의 숨어있던 의미들을 드러내고 있다. 마이클 스코긴스(Michael Scoggins)는 캔버스 대신 스프링 제본 흔적과 파란 줄들이 새겨진 노트 메모지를 사용한다. 스코긴스의 그림은 정말 친숙하다. 그의 작품 속 캔버스 대용 메모지와 그 위에 그려지거나 쓰인 낙서들은 문서와 그림을 컴퓨터 파일화해 기록하는 현대인들에게 단순한 종이가 아닌 어린 시절 향수를 전달한다. 작가는 “왜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비난하고 있는지, 어른이 되어서도 아이와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말하며 ‘성숙(Maturity)’에 대한 질문을 품은 채 관람객의 어린 시절을 호출한다.
앤 해밀턴 <The Event of Thread> 2012
파크 애비뉴 아모리 설치전경 사진: 제임스 어윙
메모지의 크기를 확대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효과는 배가 되고, 꾸겨지고 찢어지고 접힌 흔적들은 과거 어린 시절과 현재의 나를 연결해 주는 시간성을 드러낸다. 평범했던 종이와 낙서들은 과거와 현재의 내 존재를 느끼게 해주면서 이 둘을 비교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숙의 시간을 갖게 한다. 이러한 종이와 낙서, 스케치라는 소재들은 나의 과거 시간을 기록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낡고 수명을 다한다는 점에서 기억과 닮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향수, 추억, 회상을 매개시켜주는 것은 아닐까. 연필 스케치를 활용한 윤민섭의 설치 <Portrait>(2012)를 보면 그 역시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을 등장시키며 자아를 확인해 가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이 작가의 인물 설치는 얼굴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점은 관람객이 작품의 인물에게 자신의 모습을 투영시키게 한다. 그런 과정에서 자화상의 모습이 다른 누군가의 자화상으로도 변하게 됨을 안 작가는 그 작업을 매개로 관람객과 자신의 연결고리를 찾는 유대관계를 만들어 간다. 이에 대한 결과물은 <People>(2014)과 <Girl>(2013)로 나타나며 작가와 관람객은 서로를 위로 해주는 동반자가 된다.
사물을 중요 매개로 사용하는 박혜원은 붉은 실을 통해 유대감을 드러낸다. 본래 실은 이어주고 붙여주고 서로 간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물이다. 특히 붉은 실은 인연을 알려주는 장치로 전통설화에 등장했고 작가 역시 이를 이용해 자신의 작업을 진행한다. 박혜원의 작업은 여러 단계에 걸쳐 유대감을 두텁게 만드는데, 우선 전통설화라는 민족적 공유물을 끌어 들임으로써 민족적 유대관계를 맺는다. 이후 작가는 빨간색은 인연, 검은색은 단절이라는 대치를 암시하고 빨간 실로 맺어진 가까운 인연의 부재라는 개인의 경험을 관람자와 공유한다. 붉은 실은 서로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며 아픈 기억을 애도하고 다 같이 추억하는 것을 가능케 하며 서로를 다시 잇는다. 이러한 관계는 실이 만드는 중요한 가치가 된다.
허견 <Spring Hiatus> 2011
잘려진 조화 꽃잎 16×40inches (설치 모습)
아날로그 사물로부터 나오는 감성들은 대상에 대한 경험을 넘어 행동, 공간으로의 경험에서도 공유될 수 있다. 행동경험을 통한 아날로그 감성은 버튼과 클릭으로 만병통치약이 되는 것과는 다른 정성과 노동이 묻어나오는 아날로그적 행위들로부터 나온다. 허견은 조화를 잘게 조각내어 패턴 모양의 설치 작업을 만들어낸다. 수많은 조화를 마치 화산재처럼 곱게 만든 다음, 바닥에 색깔별로 가지런히 배열한다. <Spring Hiatus>(2011)는 조화를 자르는데 약 4개월, 설치에만 2주가 걸린 장기 프로젝트로 가로, 세로 약 9m, 4m의 대규모 작업이다. 8개의 반복된 색깔 패턴은 그의 어머니 결혼식 때 사들인 이불을 복제한 모양이기도 하고 어릴 적 할머니의 정원을 떠오르게도 한다.
과거 미국에 이민을 간 작가는 이 작업을 통해 당시 겪었던 자신의 정체성과 언어에 대한 혼란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데 이 작업이 도움을 주게 된다. 조화를 수집하는 순간서부터 하나하나 잘게 자르고 이들을 한데 모아 반듯하게 한국의 전통적인 색동 패턴으로 나열하는 수행적인 과정은 오랜 시간의 작업 속에서 사유의 시간을 할당받고 그에게 있어 치유의 여정이 된다. 더욱이 그의 작업은 모든 제작과정을 가족과 함께한다는 특별한 점이 있는데 그 속에서 끈끈한 가족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작가는 1만 2,000개의 조화를 자르고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하는 색동 패턴을 배열하는 과정이 그의 가장 행복한 어렸을 적 기억의 풍경을 다시 한 번 만나게 되는 기회라고 한다. 단순히 자르고 나열하는 그의 행동은 수행적인 반복, 가족과의 연대, 예술 창조라는 행위를 거쳐 가슴 속 상처를 치유하는 중요한 가치를 생산해내고 자신을 넘어 가족, 관람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마이클 스코긴스(Michael Scoggins)
<The Flash> 2012 종이에 작업
(드로잉, 수채화 등),
종이에 마커, 프리즈마 색연필 170.2×129.5cm
마지막으로 앤 해밀턴(Ann Hamilton)의 <The Event of Thread>(2012)를 보자. 뉴욕 파크 애비뉴 아모리(Park Avenue Armory)에서 열린 인터랙티브 공공 공간 설치는 대형 커튼, 실, 42개의 그네, 라디오, 낭송, 쓰기, 비둘기 등이 관람객과 함께 상호 연결된 퍼포먼스 이벤트였다. 해밀턴이 기획한 이 공간은 그네를 타고 실의 움직임과 같이 흔들거리며 공간을 탐험하고 말하기, 노래하기, 읽기, 쓰기 등의 아날로그 인간 활동을 표출할 수 있다. 특히 그네를 타는 개인적 행동 때문에 다수의 활동이 영향을 미치는 상호연결성이라는 사회적 조건을 드러내었고 모르는 사람과의 특별한 만남이 성사되기도 했다. 참가자들의 참여 퍼포먼스는 사운드, 속도, 시간과 같은 물리적 힘과 읽고, 쓰고, 듣기 등의 문학적 잠재력이 맞물리며 현실의 공간에서 벗어난 몽상적 체화를 실현했다.
필자는 사람들의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예술적인 잠재력이 언제부턴가 직군이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음을 느낀다. 누구에게나 잇 아이템(It item, 주요 아이템)은 있을 터. 그 아이템이 사물이건 기억이건 어떤 장소이건 간에 소중한 경험이자 사물 이면의 중요한 가치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에 대한 향수가 벌써 사라졌다고 한들 우리는 언제든 창조해낼 수 있는 본래 뛰어난 예술가 아닌가. 사랑을 느끼고 희망을 부르고 열정을 내뿜는 것 또한 이제는 구시대 아날로그적으로 느껴지는 오늘날에 살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원래 알고 있다.
박혜원 <Red Blossom> 2013 붉은색과 검은색의
털실을 나무, 의자, 돌에 감아 설치 설치전경
Special feature Ⅲ-Ⅱ
방식의 아날로그, 다시 등장하는 아날로그시계의 태엽
● 최형우 수습기자
아날로그는 본래 어떤 신호의 양을 나타내는 일을 뜻한다. 빛의 밝기나 바람의 세기 같은 자연적인 양이나 속도 측정 계나 온도계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나타내는 아날로그는 상태보다는 무언가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자신의 변하는 물리 값이 무엇인가로 치환되어 지시하는 이 운동은 작가가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붓질이 캔버스 위에 무엇인가로 치환되어 어떤 특정한 무언가를 표현하거나 지시하고 있는 예술 행위와 닮아 보인다. 특히 길이나 각도, 또는 전류같이 연속적으로 변하는 것들로 실재하는 결과 값이 도출된다는 점은 예술가들에게 또 다른 작업 방식의 길을 만들어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디지털이 판치는 세상임에도 아날로그의 방식과 결과물을 선호하는 작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아날로그의 메커니즘이 자신의 예술표현 방식에 들어맞는다는 것이고 확실히 아날로그만의 매력이 있다는 것일 게다. 아날로그의 특징을 이용하여 예술작업을 벌이는 작가들을 만나보고, 이들의 작업으로 인해 드러나는 아날로그를 살펴보자.
양진우 <Slight Monumet Scene2>
2010 오브제와 혼합재료 450×400×300cm
사유를 위한 아날로그: 자신의 생각을 아날로그 기술로 표현한 사람들
양정욱의 작업 결과는 삐거덕삐거덕 소리 나는 키네틱의 아날로그 구조물로 도출된다. 모터와 서로 맞물려 연결된 재료들의 향연은 어두운 방 안에서의 조명과 어우러져 하나하나의 주목도를 높이고, 눈앞에서 파악할 수 있고 실재하는 움직임은 아날로그의 강점이자 작가의 특색으로 나타난다. 몸으로 체화된다는 말이 적절할까. 작품과의 마주침은 관람객들을 거북이로 만들거나 노인 병원에 가게하고 혹은 내 아버지의 머리를 상상하게 하는 데 성공한다. 그의 작업에서 흥미로운 지점은 제목이 지시하는 스토리와 구조물 사이의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곧 작품의 움직임과 형태, 구조적 특징, 혹은 아우라가 그 빈 공간을 채우고 관람객은 이들을 이용해 구조물과 제목을 껴 맞춰 본다. 그의 작업이 첨단 기계가 아닌 직조되고 모든 움직임 과정의 원리가 노출되는 로우-테크(low-tecnology)라는 점은 세세한 촉각적, 시각적, 청각적 변화 하나하나를 느낄 수 있게 한다. 0과 1 사이의 무한 실수가 체험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앙드레 마에노(Andre Maeno)의 아날로그 기계들은 결과물이 아닌 결과물을 감상하거나 끌어내는 작동 장치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주목해야 할 점은 그가 정한 주제를 실현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가정과 법칙, 그리고 그에 따른 기계의 구현화 과정이기도 하다. 특히 그는 추상적 대상의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한 매체로써 아날로그 기계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주목할 만하다. 그의 최근 작업 <Daily Delay>(2015)는 과거의 자리를 다시 현재로 불러들여 같은 장소를 같은 공간 위에 중첩하고 있다. 공간을 인지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시각적인 부분을 주로 사용하지만 그의 작업은 장소를 녹음하는 과정이기에 우리는 그 곳을 청각으로 인지하게 된다. 과거에 녹음된 자리는 현재의 공간 안에서 재생됨으로 그 두 개의 장소가 같은 시간 위에 놓이게 된다. 그의 ‘24시간 딜레이’ 기계는 같은 공간을 청각화 하여 시간으로 분해하고, 동시에 관람객들을 한 곳에 있지만 동시에 두 곳에 같이 있게 한다.
또 다른 작업 <Th*****-Some of Sound Equipment>(2011)는 사람들 각자마다 관념 속에서 정의된 각자의 천둥소리를 찾아 나서는 작업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는 관념을 떠올리기 위해 천둥소리에 관한 관념을 생각하게 하고 이를 소리로 구현화 시키고 있다. 일상이나 관념 같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닌 비물질들을 아날로그 기계를 통하여 구현하는 작업방식은 그 구체화 과정의 틈 사이에서 여러 가지 상상력과 잠재력, 그로 인해 뻗어 나가는 또 다른 사유를 가능하게 해준다. 수치화하고 계산하여 도출해내어 물질적이고 실제로의 구현을 원하는 아날로그는 추상과 구상의 접점을 관계시키는 트리거가 된다.
양정욱 <언제나 피로는 꿈과 함께> 2013 나무,
실, 모터, pvc 2,300×2,800×2,300cm 사진: 김남희
아날로그의 사유: 아날로그 매체의 특성 자체를 보여주고 드러내는 사람들
앞서서는 사유를 아날로그화 했다면 지금 소개할 작가들은 아날로그로부터 사유를 끌어내는 작업을 보여준다. 이들의 작품을 보고 있으면 우리는 아직 아날로그 기계가 가지고 있고 내포하고 있는 여러 현상이나 가능성을 다 파악하기도 전에 너무 빨리 디지털로 넘어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들의 작품은 아날로그 매체만이 발휘할 수 있는 사운드나 신호 또는 현상들을 탐닉하고 탐구하며 오늘날의 일상적인 인식들에 비수를 꽂는다. 전형산은 소리가 아닌 소리를 소리화 한다. 쉽게 말해 <불완전한 사실성 #10>(2009)에서는 돌에서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를 소리에 마이크를 밀어붙여 돌의 소리를 소리화 한다. 소리가 없다는 말은 말 그대로 소리가 없다고 여기겠지만, 역으로 없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말도 된다. 그의 사운드 작업은 아날로그 매체가 들려주는 소리들을 탐구한다. 라디오 주파수에서의 소음, TV의 딜레이를 통한 잡음, 심지어 정글짐에서 나는 소리까지도 예술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인다.
존 케이지(John Cage)가 주변에서 편히 들리는 일상 소리를 음악화 했다면 전형산은 일상에서도 듣기 싫어 디지털이 걸러낸 잡음들을 음악화 하고 있다. <선험적 편린들 #6; Meter>(2014)는 계량기가 작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기는 잡음을 하나의 비트로 파악하고 소리를 확대한다. 더군다나 관람객은 콘센트를 꽂고 빼고를 하면서 계량기의 비트를 조율한다. 이 작품에서 들리는 소리는 인식 이전의 소리와 이후의 소리로 나뉜다. 즉 계량기의 굉음이 비트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람객들의 소리에 대한 인식은 확장된다. 다른 측면으로 주목할 지점은 작가가 아날로그 소리를 사회적 구조영역까지도 의미를 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이다. <불가항력적인 지각 #6; Arbeit macht frei>(2010)는 피아노 치는 행위를 노동의 행위로 환산한다. 피아노에 망치를 조합해 피아노 본연의 소리보다는 제3의 소음이 생산되는데 타자로서 노동자는 소리의 타자인 소음과 연결된다. 노이즈를 계속 소리화하고 있는 작가는 이제 노동자들 또한 타자의 수렁에서 건져 내려 하고 싶은 걸지도 모른다.
앙드레 마에노(Andre Maeno)
<thxxxxx-some of sound equipment 2011> 2011 나무,
전자부품, DC모터, 쇠파이프, 스테인레스, 천, 압력센서, 와이어,
rf송수신기, 앰프, 스피커 가변크기 (2014 설치전경)
반면 석성석은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가장 큰 차이인 분절과 연속성을 바라보며 연속성이 분절됨에 따라 분절과 분절의 버려진 것들에 대해 작업으로 말한다. 작년에 열린 그의 개인전은 아날로그 TV에서 나타나는 전자 신호에 대한 의미화의 과정이었다. 전자신호의 잡음은 디지털로의 전이 과정 중 쓸모없는 것으로 치부되어 사라졌던 것들이지만 작가는 의도적으로 잡음들을 시각화함에 따라, 잡음의 부재 시대인 오늘날의 그 잡음들은 더는 잡음이 아닌 잡음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시각화인 셈이다. 그의 아날로그 TV에 대한 실험들은 단순히 신호를 보여주는 것에 멈추지 않고 신호를 주고, 받고, 멈추는 과정을 통해 부재했던 신호 체계를 드러내고 있다. 신호에 대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더 나아가 오늘날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부재하고 있는 목소리의 정체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라는 두 개의 시대가 왔다가 사라지고 서로 마주 보고 있는 오늘날, 이 둘의 비교는 서로에 대한 과잉과 부족을 가리키고 있다. 아직은 디지털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인 만큼 디지털의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고효율, 자동화의 극한을 추구하면서 인간의 가치는 점점 등한시되고,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철저히 적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만남은 서로를 견제하고 자극할 것이 분명하다. 상호에 대한 피드백은 쌍방향으로 해체시키고 다시 재구성할 것이고 노이즈가 정보가 되듯 언제고 전복될 수 있다. 그러기에 현재의 아날로그 매체의 탐구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뿐더러 언제고 주목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전형산 <선험적 편린들#3; Radius> 2014 혼합매체, 사운드설치
(라디오 수신기, 송신기,타자기, 코일, 모터, 스피커) 가변설치

Special Feature
오늘의 일상을 그토록 색다르고 멋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Special Feature
원-맨 아트워크: 스스로 기획하고 연출하는 예술가들
Special Feature
공포가 예술에 물드는 사이, 더위를 잊다
Special Feature
텍스트: 미술 트렌드를 읽는 완벽한 수단
Special Feature
예술이 사건을 기억하는 법
Special Feature
쇼미 더 머니 블링블링, 사치스럽고 럭셔리한 미술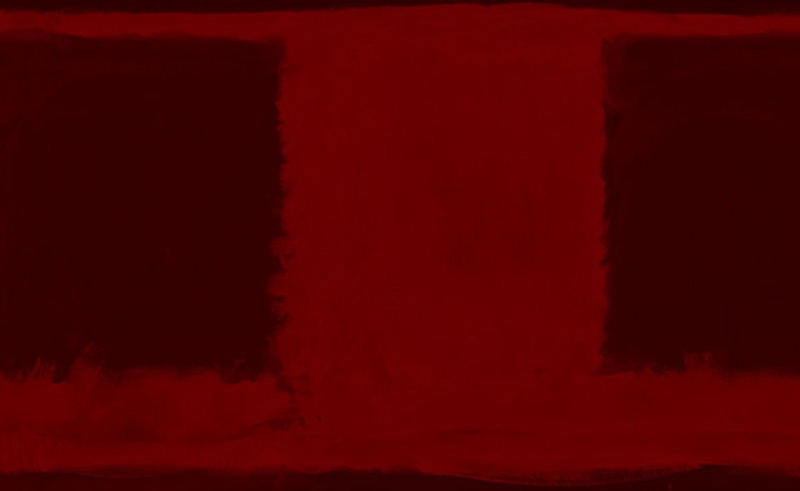
Special Feature
타장르 속 미술가, 현실과 환상의 경계에서
Special Feature
권영우: 종이 텍스처의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