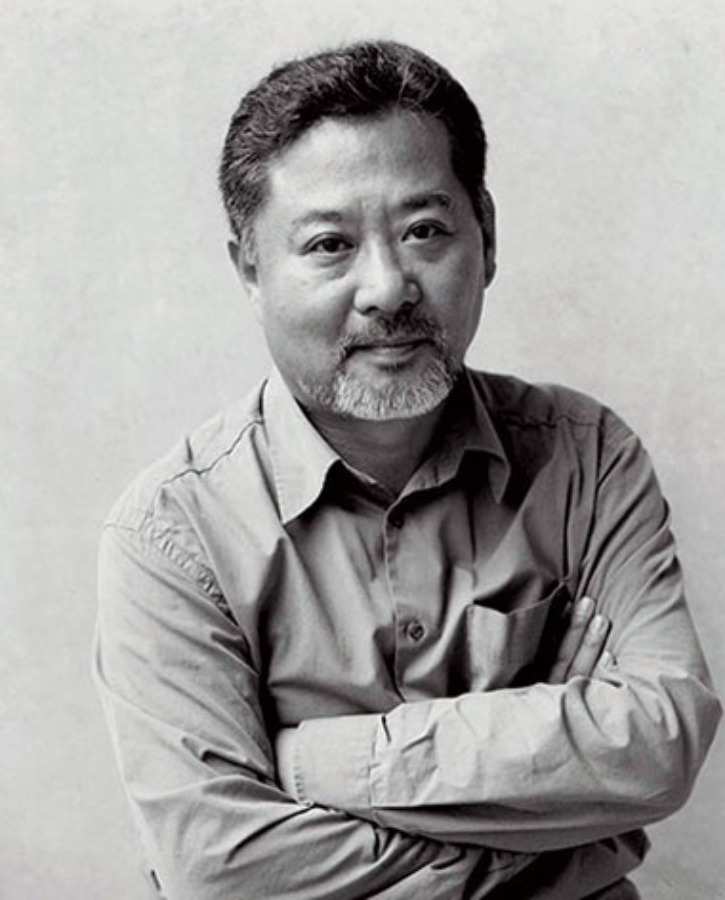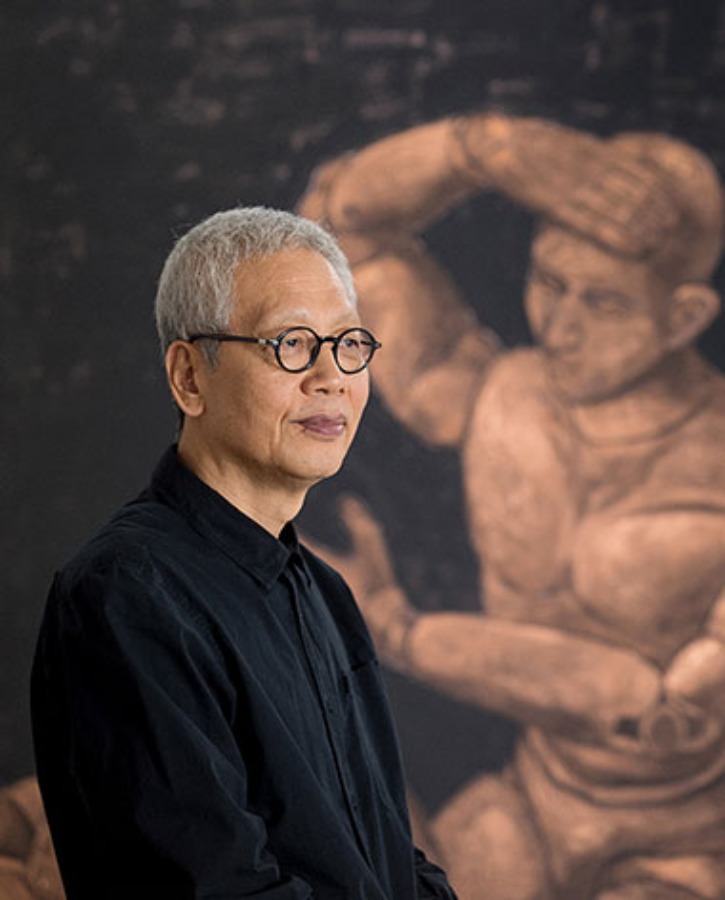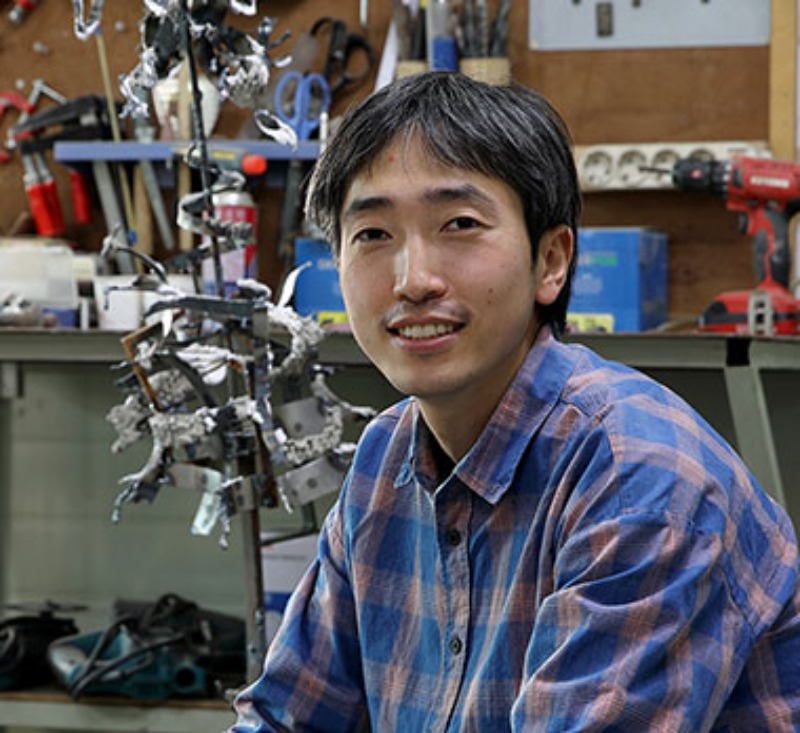은회색의 거친 표면에 가해진 충격으로 분화구가 생긴다. 가장자리는 섬세하게 감치기를 한 듯하고, 긴 분출물은 낡은 은빛 타원을 만들어낸다. 때때로 멀리까지 뻗어있는 이 흔적들은 코르디예라와 바다 사이, 페루의 척박한 땅에 나스카 문명이 남긴 기묘한 지상화를 닮았다. 처음으로 작가 박동수의 작품을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다. 하나의 세계, 어쩌면 또 다른 세계가 나에게 하늘에 대해 이야기하는 듯했다. 마치 달에 착륙한 것 같은 느낌, 그러나 대기(大氣)에 대한 걱정도 없고, 에르제(Hergé)의 만화 속에 나올 법한 우주복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그것이 그의 작품을 처음 봤을 때 든 기억이다. 박동수의 작품을 통해 우리는 달 위를 걸었다.
파리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Guimet)의 꼭대기 층보다 그의 작품을 전시하기 더 좋은 곳이 있을까? 나는 2013년 관장 부임 이후 정기적으로 현대 예술가들을 초대해 4층의 로툰다(Rotunda) 전시를 맡겼다. 이에나 광장(Place d'iéna)이 내려다보이는 개방형 원통 창문 위에 지상에서 6m 이상 떨어진 돔이 솟아 있는 이곳은 마법 같은 장소다. 금속 아치형 구조로 어우러진 둥근 천장을 보면 누구라도 천문대를 떠올릴 것이다. 미래와 경이로움을 그려내던 19세기의 위대한 소설가 쥘 베른(Jules Verne)의 작품 속이라도 된 듯 갑자기 돔 천장 일부가 미끄러지며 열리고 하늘이 보이며 망원경으로 관측을 하는 기대를 하게 된다.
<Cette place-là>
전시 전경 2023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사진: Jérôme Michel
이 공간에서 전시를 하려면 공간의 특성을 이해하고 탐색전을 해야 한다. 수년 동안 열정적인 창작물들을 선보였고, 많은 작품이 우리를 매료시키며 놀라게 하고, 감동을 안겼다. 하지만 박동수의 작품처럼 공간에 대한 적응을 넘어 예술가와 공간 사이에 정신과 본질이 하나됨을 느낀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의 작품은 내가 수년간 이야기해 온 “로툰다는 하늘과 대화한다”는 말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그것이 바로 박동수의 작품이 놀라운 이유다. 생각해 보면 현대미술에서 우주 공간의 존재에 대한 흔적을 이토록 많이 보여주는 작품도 별로 없다. 그리고 이는 공상 과학 소설 속 차가운 우주가 아니다. 시적인 우주의 느낌이다. 마치 인류 최초로 달에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기 67년도 전에 만들어진 조르주 멜리에스(Georges Melies) 감독의 영화 <달세계 여행(A Trip to the Moon)>(1902)에 나오는 이미지 같다.
박동수의 작품 특징 중 하나는 표면을 일정한 단위로 파편화한다는 것이다. 그가 그려내는 기하학적 무늬는 혼돈을 지배하는 질서를 세운다. 금속을 연상시키고 강철을 입힌 듯한 색조, 때때로 검은색 행렬이 점점이 박힌 흰색을 바탕으로 공들여 표면을 작업한 캔버스에는 정제된 격자무늬와 일정한 간격으로 섬들의 무리가 만들어진다. 기메 박물관 전시를 위해 그는 전체 작품 중 돔 형태에 맞춰 전시실 중앙에 육면체들을 평행하게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리는 첫 회의에서 육면체들이 돔 천장 꼭대기로 수렴하듯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게 배열하자는 아이디어를 냈다. 마치 둥근 천장에 어떤 힘이 있어 이들을 흡수하는 것처럼 말이다.
<Cette place-là> 2022
나무에 한지, 먹, 아크릴릭, 석고 각 93.8×93.8cm
사진: 박정우
중앙으로 갈수록 ‘큐브’들의 높이는 급격히 높아진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연속적인 계단을 이루고 있어 측면으로 미끄러진 안료의 마그마 같은 흘러내림, 표면의 흉터와 같은 입체감, 어두운 바탕에 흰색과 푸르스름한 반사의 대비 등 모든 면을 사용하고 감상하게 된다. 모순어법으로 ‘차가운 끓음’이라고까지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다. 이 작품은 또 한 번 우리를 먼 우주로 데려가 음(陰)의 온도, 절대 영도 같은 물리학의 복잡한 개념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러한 물리적인 개념을 넘어 박동수의 작품은 우리 안에 있는 더 가까운 무엇, 그러나 멜리에스 감독이 꿈꾸었던 유머러스한 달보다는 더 멀리 있는 또 다른 무언가를 이야기한다. 이 작업에 미술사에서 유명한 예술 운동의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다. 바실리 칸딘스키(Wassily Kandinsky)의 『예술에서의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Über das Geistige in der Kunst)』가 1910년경 출간된 후 한 세기도 더 흘렀지만 그의 글은 여전히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박동수는 칸딘스키가 그토록 사랑한 ‘내적 필연성(inner necessity)’의 예술가다. 흰색, 검은색, 회색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작품 내 색조가 그것뿐인 것은 아니다.
<Cette place-là> 2022
나무에 한지, 먹, 아크릴릭, 석고 각 93.8×93.8cm
사진: 박정우
세 가지 색만이 아닌 다른 색채들이 칸딘스키 관점에서 긴장이 아닌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으로 흘러나온다. 흰색과 검은색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만나는 것이다. 이분법적인 관계가 아니다. 검은색은 죽음의 색이 아니다. 동양에서 검은색은 공허함이나 부재가 아니며 흑백이 넉넉하게 예비한다는 관계로 공존하고 있어 그 특성이 다르다. 박동수의 ‘팔레트’의 본질은 스스로의 정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며, 우리가 참조하는 분류를 따른다면, 그의 조형적 언어도 마찬가지다. 개인적으로 그가 표현하는 형태와 형식의 다채로움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박동수는 자신의 ‘회화적 표면’을 동일한 형태의 작은 개체들이 일정한 간격을 이루는 형태로 자주 해체한다. 이는 칸딘스키의 세계와는 거리가 먼 작품을 떠올리게 한다. 아시아 전통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다라(Mandala)가 대표적이다. 본질적으로 만다라는 코스모그램(cosmogram)이다. 우주 공간과 내면의 영적 공간에 대한 개념을 ‘도형’에 압축한 것이다. 인도네시아의 보로부두르 사원처럼 부조로 건축물에 새겨졌든, 히말라야 탕카 두루마리에 그림으로 그려졌든, 만다라는 서양인의 닫힌 눈으로 보는 모든 공간적 단위를 거부한다.
![]() <Cette place-là> 전시 전경 2023
<Cette place-là> 전시 전경 2023 프랑스 파리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사진: Jérôme Michel
엄격하게 조직화되고 분할되어 있지만 해독할 수 없는 표면, 대개 원형으로 표현되는 중심부의 가장 중요한 산, 오방(五方)의 다섯 방향을 나타내는 도식에는 중앙도 포함되어 있다. 나는 4세기 후반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한국의 전통 속 만다라를 알지 못한다. 한국에서는 샤머니즘과 그 정신이 깃든 독특한 형태로 발전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일순위는 ‘칠성(七星)’, 즉 행성들의 영혼 큰곰자리다. 박동수가 자신의 작품으로부터 나온 가설과 해석의 미로 속에서 칠성의 정신을 고려했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은 우주에 대해, 우주를 한국과 연관 짓는 일련의 수단을 통해 그 변화에 대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1990년 프랑스에 도착해 많은 한국 젊은 예술가들의 등용문이었던 베르사유 시립미술학교(École des Beaux-Arts de Versailles)에 입학한 후, 박동수는 익숙했던 한지라는 재료에 자연스럽게 주목했다. 뛰어난 내구성을 가진 한국의 종이 한지에 풀칠을 하고, 붙이고, 먹으로 색을 입히고, 밑그림을 가지고 논다. 온통 검은색인데 얼핏 푸른빛을 띠는 것처럼 보이는 등 색채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속인다. 먹이 말을 걸어온다. 작가는 화산 폭발 잔해처럼 보이는 평행의 육면체 표면에 흉터를 남기거나 재료를 덧입혀 부조를 만들어낸다. 우리는 지금 사라진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서 있는 걸까, 아니면 빅뱅 직후를 보는 걸까? 작품 <그곳에(Cette place-là)>에서 작가는 우주 생성론과 우주 구조론을 결합했다. 그렇게 그는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 만다라를 창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Cette place-là> 2022
나무에 한지, 먹, 아크릴릭, 석고 각 93.8×93.8cm
사진: 박정우
한지는 매트릭스와 같다. 일단 자국을 남기고 복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종이 한 장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어 그림에 리듬감을 부여하고, 벽에 거는 형태도 제한적이다. 전시관 바닥에서 원통형 측벽으로 올라가며 공간과 작품이 하나로 완성되는 경험도 하게 된다. 산, 분화구, 화산암은 바닥의 빈 공간을 넘어 벽의 구역을 나누는 단위로 기능할 수 있게 되며, 그 자체로 작품의 일부가 된다.
벽에는 분출되어 흘러내리는 용암이 판의 형태로 걸려 있다. 조금 큰 크기의 이 판은 ‘그 후의 순간’을 박제해 놓은 듯하다. 주변을 둘러보면 하늘의 모습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 있다. 강렬한 흰색 바탕의 대형 캔버스 두 개에 우주 먼지를 담은 검은색 성단(星團)이 눈에 띄고, 작은 캔버스를 여러 개 모아 놓은 작품은 정사각형 안에 원 모양을 반복하며, 현미경 렌즈를 통해 세포와 무척추 동물로 가득한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같다. 이는 생명의 뿌리, 원생 동물, 정자, 박테리아이다. 모든 생명체가 여기 모여 있다.
<Cette place-là> 2023
캔버스에 아크릴릭, 수채 72.4×72.4cm
사진: 박정우
이렇듯 박동수는 모든 왕국과 우주 생성의 역사를 ‘그곳(cette place-là)’에 모은다. 지구의 형성, 지각운동, 화산 폭발로 인한 암석과 용암의 혼돈, 캡슐화된 퇴적물과 화석, 생명의 소우주와 모든 생명체의 발아 등 작품을 통해 러브크래프트(Lovecraft)의 소설 속 여행, 생명의 기원에 대한 숭고한 명상으로 우리를 이끈다. PA
박동수 작가
작가 박동수는 1964년 충청남도 서산에서 태어나 프랑스 베르사유 시립미술학교(École des Beaux-Arts de Versailles)와 파리 8대학(Université Paris-VIII)에서 학사와 석사를 졸업했다. 1990년 프랑스에서 활동을 시작한 그는 먹, 한지, 나무, 아크릴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며 특유의 작품세계를 구축해 왔다. <PARK DONG-SOO>(백슬래시, 2023), <Carte blanche>(프랑스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2023), <ASIA NOW>(갤러리 민스키, 2020), <Ce place-là>(갤러리 민스키, 2019), <박동수 개인전>(갤러리소헌, 2018) 등의 개인전을 개최했으며, <ASIA NOW>(백슬래시, 2023) 등의 그룹전에 참여하는 등 세계 각국에서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Cette place-là> 2022
나무에 한지, 먹, 아크릴릭, 석고 각 94×94cm
사진: 박정우
Park Dongsoo
Sur la terre comme au ciel
● Sophie Makariou, Conservatrice générale du Patrimoine, Présidente honoraire du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 Guimet
Les impacts dans la croûte grise-argentée ont formé des cratères dont les bords sont délicatement ourlés ; de longues giclées projettent des ellipses de vieil argent. Elles se prolongent parfois sur la distance et ressemblent aux géoglyphes étranges que la civilisation des Nazcas a laissé dans le sol aride du Pérou, entre Cordillère et océan.
Voilà ce que j’ai pensé d’abord en voyant l’œuvre de Park Dongsoo: c’était un monde, peut-être un monde d’ailleurs, qui me parlait du ciel. C’est le premier souvenir de ma rencontre avec l’œuvre de Park Dongsoo: la sensation d’avoir atterri sur la lune, une lune où l’on ne se soucierait pas d’atmosphère, où l’on ne serait pas encombré d’une combinaison-scaphandre digne d’un album d’Hergé. Mais avec son œuvre, nous allions marcher sur la lune.
Et où mieux le faire qu’au dernier étage du musée national des arts asiatiques - Guimet à Paris, que je dirigeais? J’avais invité régulièrement depuis mon arrivée au musée en 2013 des artistes contemporains à investir la ‘rotonde.’ Le lieu est magique : dominant la place d’Iéna, un cylindre ajouré de fenêtres est surmonté d’une coupole qui culmine à plus de 6 mètres au-dessus du sol. Elle est rythmée par les arceaux métalliques de sa structure qui rappelle immanquablement celle d’un observatoire. On s’attend à tout moment, ainsi que dans un roman de Jules Verne - le grand romancier d’anticipation et de merveilles du 19ème siècle -, à voir glisser et s’escamoter un des pans de membrane de la coupole entre les arceaux et se révéler le ciel pour une observation au télescope.
Pour habiter ce lieu, il faut en comprendre le génie et s’y mesurer. Il y eut, au long des années, quantité de propositions de créations passionnantes et beaucoup nous ont enchantés, émus, étonnés. Mais peut-être jamais n’ai-je senti comme avec le travail de Park Dong-Soo que, au-delà de l’adaptation à l’espace, il y avait une connivence d’esprit et d’essence entre un artiste et ce lieu.
De l’œuvre de Dongsoo je peux dire exactement ce que j’ai dit pendant des années de la rotonde : “elle parle au ciel.”
Et c’est ce qui provoque l’émerveillement. Si j’y réfléchis, je ne vois pas tant de traces de la présence d’un espace cosmique dans l’art contemporain. Et encore n’est-ce pas un cosmos empreint de science-fiction. Il n’est pas froid, il a la qualité de poésie des images du film de Louis Méliès, ‘le voyage dans la lune,’ réalisé 67 ans avant que le premier homme fasse un grand pas pour l’humanité.
Un des traits de l’œuvre de Dongsoo est la fragmentation de la surface en unités régulières. Sa géométrie introduit de l’ordre, elle maitrise le chaos. Ses ‘toiles,’ à la surface patiemment travaillée - qu’elle évoque le métal par ses teintes aciérées ou tantôt d’un blanc parsemé de processions noires -, forment un archipel strictement quadrillé et régulièrement espacé.
Dans l’œuvre totale qu’il a créée pour le musée de la place d’Iéna, il a proposé un ensemble de parallélépipèdes placés au centre de l’espace, à l’azimut de la coupole.
Lors de notre première rencontre est apparue l’idée que ces volumes soient arrangés de manière à converger vers le sommet, leur hauteur augmentant de la périphérie vers le centre ; comme si le sommet de la coupole aspirait l’ensemble par un effet d’attraction. Vers le centre, la hauteur des ‘cubes’ s’amplifie soudainement. Les étages successifs de l’ensemble de volumes permettent d’apprécier l’usage de toutes les faces: ruissèlement magmatique de la peinture glissant sur les côtes, scarification des plans, contrastes des blancs et des reflets bleutés sur les faces plus sombres. Je ne sais si on peut pousser l’oxymore jusqu’à parler d’une ‘ébullition froide’ mais c’est l’image qui me vient à l’esprit et à nouveau elle évoque le lointain cosmos qui nous fait réfléchir à des notions de physique complexes : températures abyssalement négatives, zéro absolu.
Pourtant, au-delà de ces considérations physiques, l’œuvre de Dong-Soo nous parle d’autre chose, à la fois plus proche, en nous, et pourtant bien plus lointain que la lune rêvée non sans humour par Méliès. Son travail pourrait recevoir le titre d’un manifeste célèbre de l’histoire de l’art. ‘Du spirituel dans l’art’ a été publié par Kandinsky en 1910. Plus d’un siècle après sa rédaction le texte résonne encore. Park Dongsoo est un artiste de la ‘nécessité intérieure’ chère à Kandinsky. Sa palette ne se résume pas aux blanc, noir et gris, même s’ils sont prédominants; d’autres suggestions de couleurs viennent irriguer un trio qui ne fonctionne pas en tension, suivant la perspective de l’artiste russe, mais en une graduation suave. Le blanc et le noir ne s’y opposent pas mais s’y rencontrent. Leur relation n’est pas binaire. Le noir n’est pas une couleur de mort. En Asie le noir a d’autre qualité : il n’est pas un vide, une absence, il entretient avec le blanc une relation pleine de réserve. Pour l’essentiel la ‘palette’ de Dongsoo défie la définition, tout comme son vocabulaire plastique d’ailleurs, si l’on s’en tient à nos catégories de références. Le plus significatif est, à mon sens, la versatilité de ses formes et de ses formats.
La décomposition fréquente de sa ‘surface picturale’ en petites entités de format identique, régulièrement espacées, amène à l’esprit des œuvres bien éloignées de l’univers de Kandinsky. Ce sont les mandalas d’une grande partie des traditions de l’Asie. Essentiellement le mandala est un cosmogramme. Il contracte en une ‘ figure’ les notions d’espace cosmique et d’espace spirituel intérieur. Un mandala, qu’il soit sculpté et monumental comme le temple de Borobudur en Indonésie ou peint comme les rouleaux himalayens, refuse à nos yeux occidentaux corsetés toute unité spatiale: bien que strictement organisée et divisée, la surface représentée est indéchiffrable; au centre, la montagne primordiale adopte le plus souvent une forme circulaire; le diagramme rend compte des ‘cinq directions,’ le centre en faisant partie.
Je ne connais pas de mandala dans la tradition de la Corée, qui adopta dès la seconde moitié du 4ème siècle le bouddhisme. Il s’y développa une forme singulière imprégnée de chamanisme et de ses esprits. On y retrouve au premier rang Chilsong, la grande Ourse, l’esprit des planètes.
Je ne sais pas si dans le labyrinthe d’hypothèses et de lectures que suscite son travail, Park Dongsoo a envisagé l’esprit de Chilsong. Mais tout nous y parle de l’univers, de sa transformation à travers un ensemble de moyens qui le rattachent à la Corée.
Arrivé en France en 1990, inscrit à l’Ecole des beaux-arts de Versailles qui fut une véritable porte d’entrée pour beaucoup de jeunes artistes coréens, Dongsoo eut recours à un matériau qu’il maitrisait naturellement: le papier hanji, papier coréen d’une remarquable résistance. Il l’encolle, le maroufle, le colore avec de l’encre, jouant des sous-couches pour tromper notre perception des couleurs; le noir est partout, bien qu’il nous semble parfois virer au bleu. C’est l’encre qui parle. Sur les parallélépipèdes qui sont comme les scories d’une explosion qui aurait fait disparaitre le volcan même, Dongsoo crée des reliefs par scarifications ou ajout de matière. Sommes-nous au bord du cratère disparu ou juste après le big bang ? Dans son dispositif imaginé pour le musée, nommé <Cette place-là>, l’artiste conjugue cosmogonie et cosmographie. Peut-être crée-t-il le mandala que nous n’attendions plus.
Le papier hanji est matriciel: d’abord parce qu’il prend et restitue les empreintes. Aussi parce qu’il impose un rythme à sa peinture, les dimensions de ses feuilles contraignant le format des unités accrochées au mur. On assiste ainsi à un relèvement du plan du sol sur les murs de la rotonde du musée, parachevant l’unité du lieu et de l’œuvre. Montagne/cratère/scories fonctionnent comme les unités qui quadrillent le mur au-delà du vide du sol, lui-même intégré à l’œuvre.
Sur les murs, la projection magmatique, les coulées, ont fait comme un tablier de lave sur un plus grand format, qui fige le ‘moment d’après.’ Sur le pourtour encore, le bulletin du ciel se décline sous différentes formes; des amas noirs de poussière d’étoiles se détachent sur le fond puissamment blanc de deux grandes toiles tandis que des assemblages de petits formats répètent l’inscription d’un cercle dans un carré; là, à travers la lentille d’un microscope il nous est donné de voir un monde grouillant de cellules, d’être invertébrés. Ce sont des racines de vie, formes protozoaires, spermatozoïdes, bactéries. Tout le vivant s’y presse.
Ainsi en <cette place-là> Park Dongsoo a réuni tous les règnes et l’histoire de la formation du monde sous la coupole céleste du musée: la formation de la terre, l’orogénèse, le chaos de roches et de lave des éruptions, les sédiments et les fossiles encapsulés, le microcosme du vivant et la germination de tous les ordres du vivant. Ce faisant, il nous emmène dans un voyage digne de Lovecraft et dans une sublime méditation sur l’origine de la vi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