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Maker | Art in Post |
|---|---|
| Origin | Made in Korea |
| 구매방법 | |
|---|---|
| 배송주기 |
정기배송 할인 save
|

| 옵션선택 |
할인가가 적용된 최종 결제예정금액은 주문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시물이 없습니다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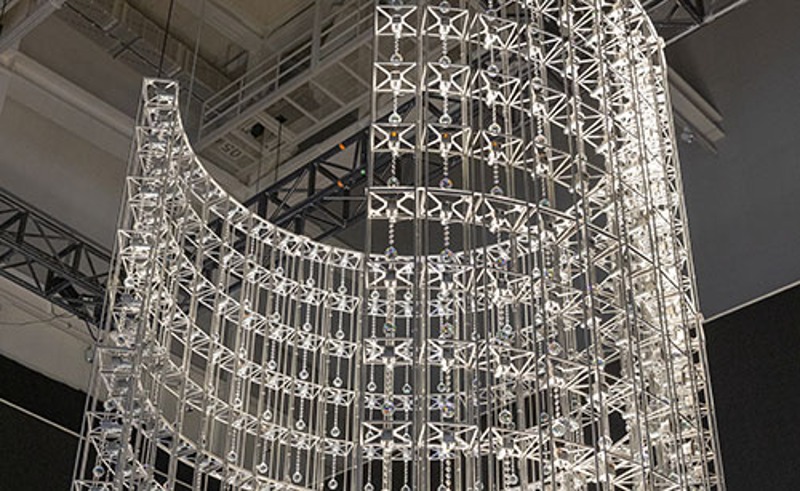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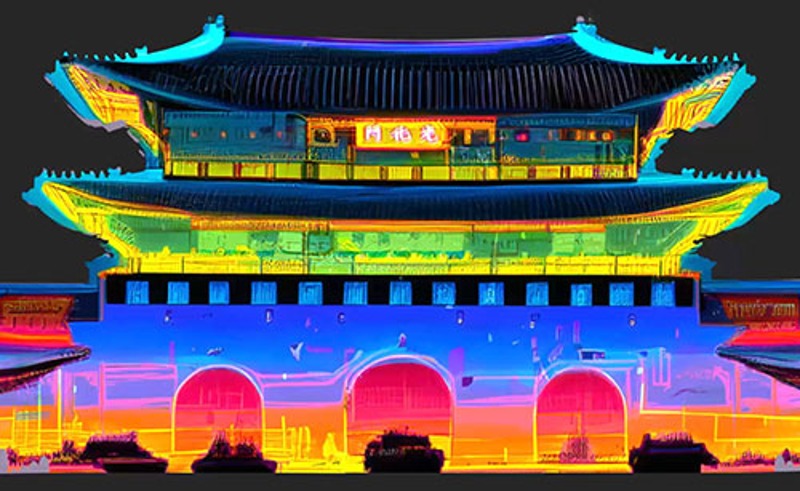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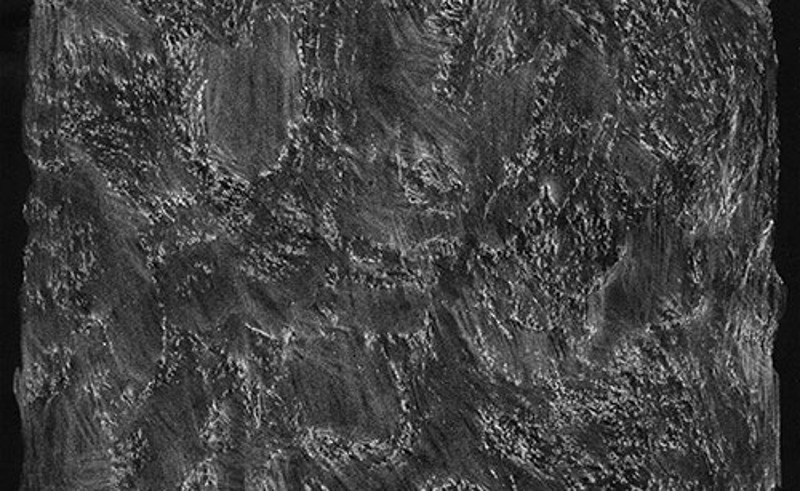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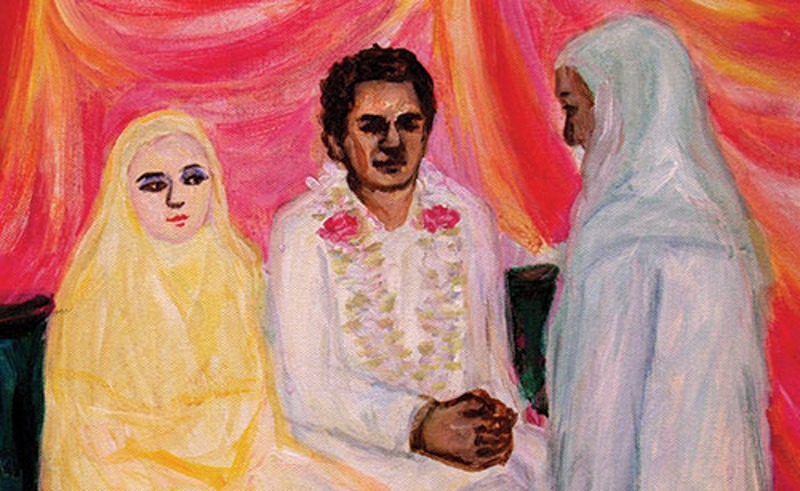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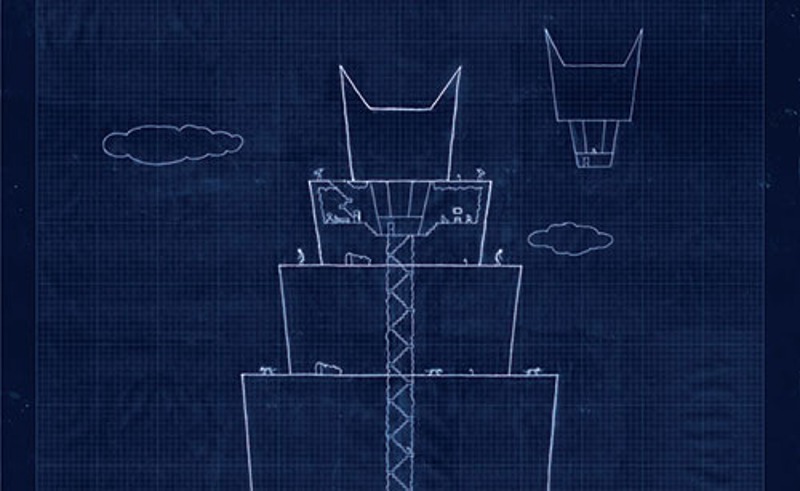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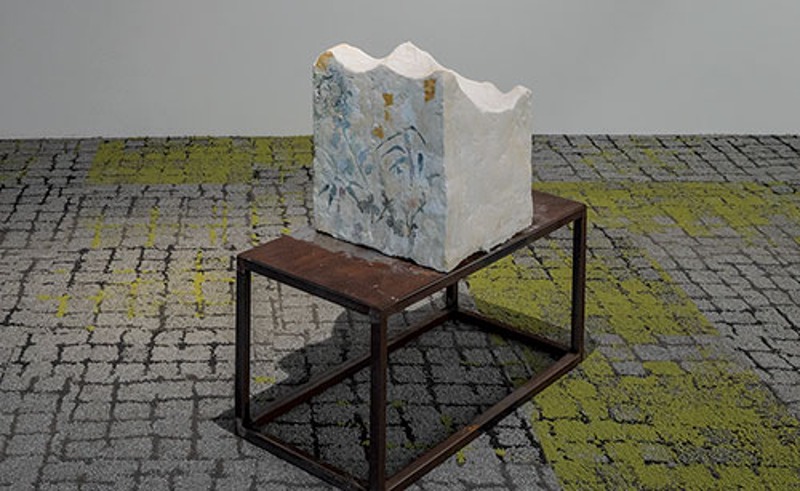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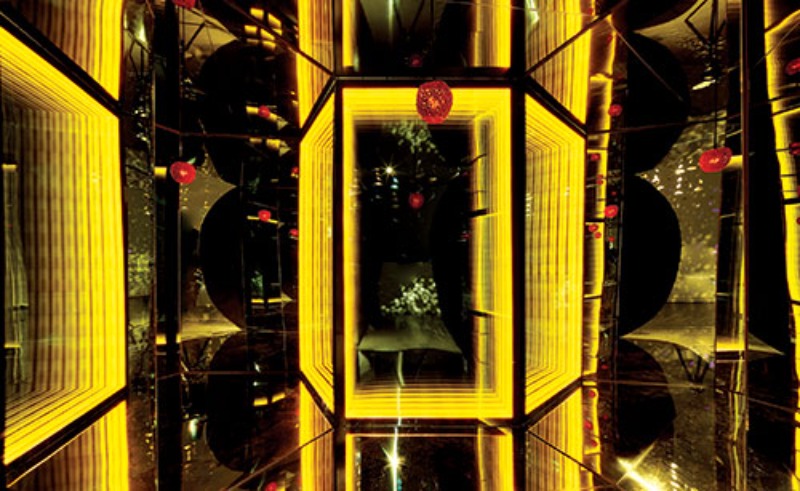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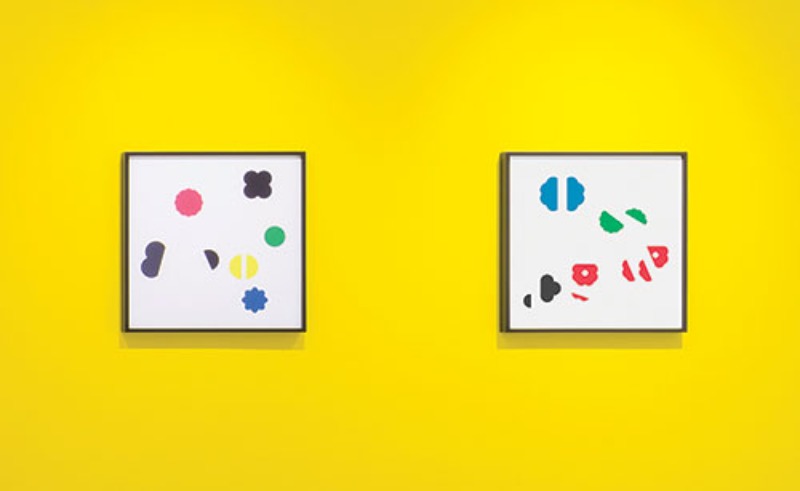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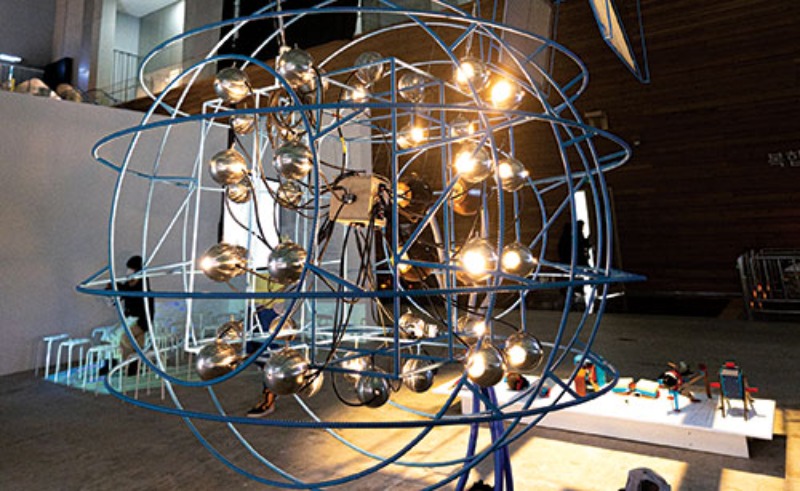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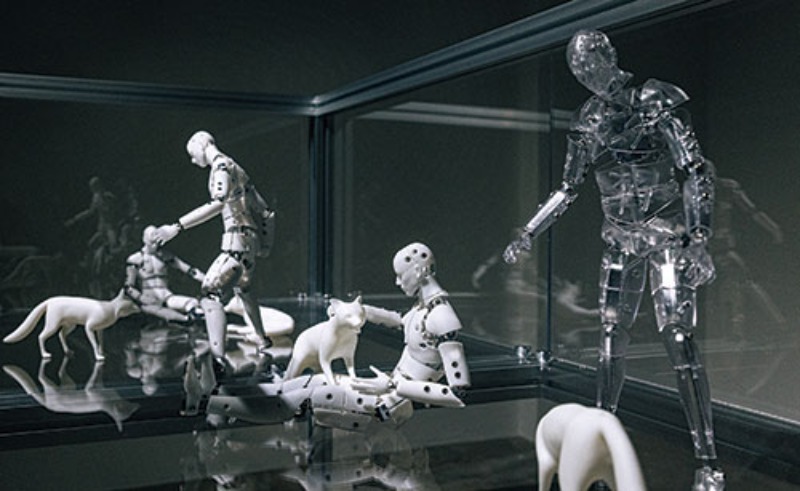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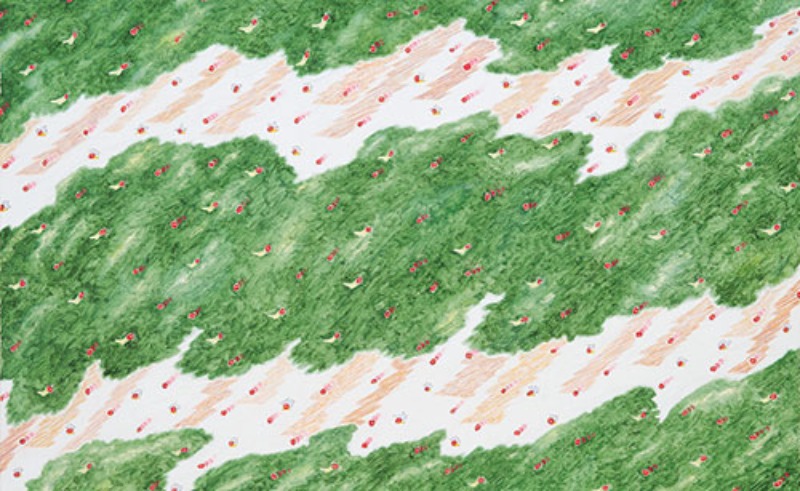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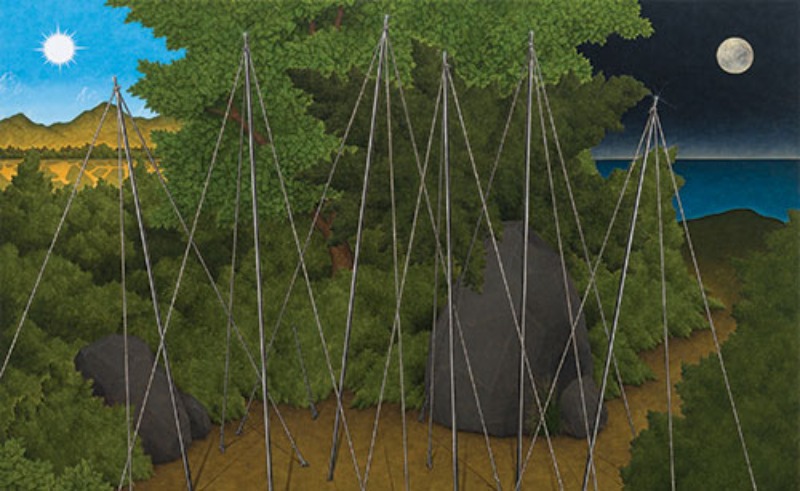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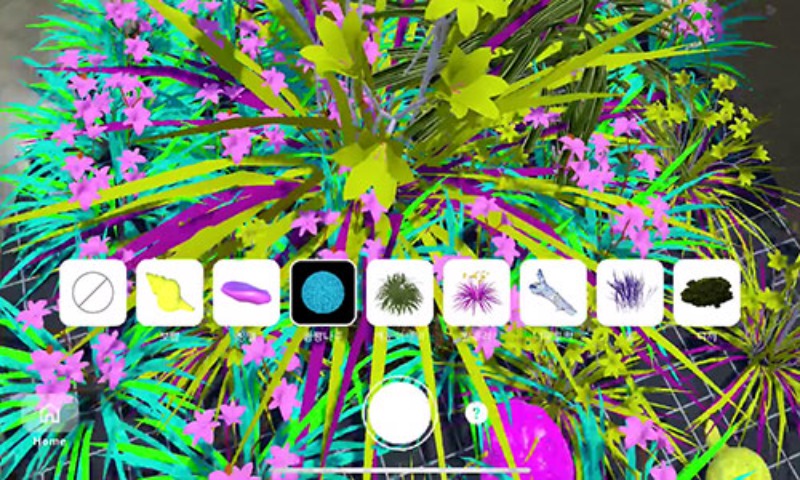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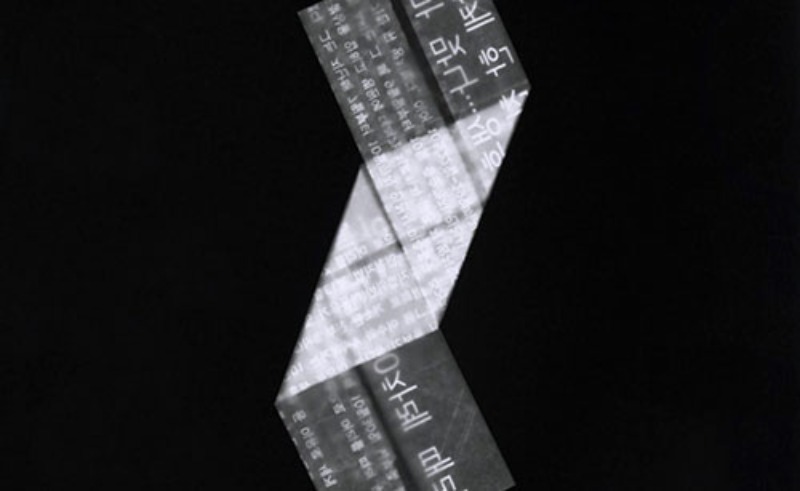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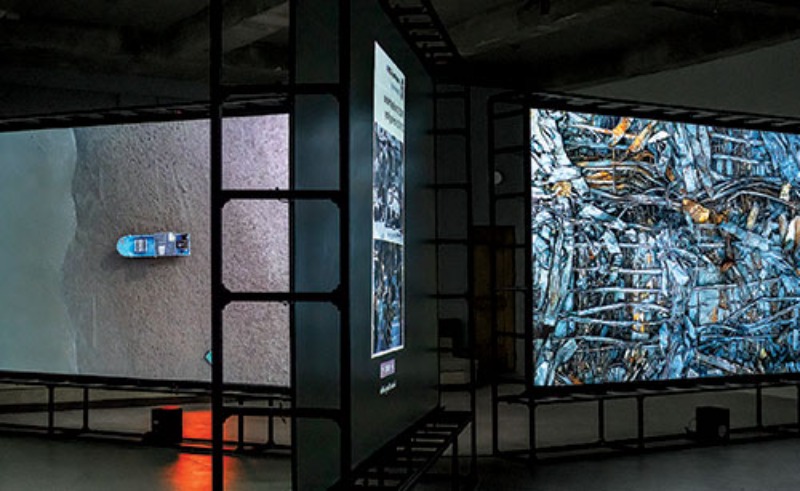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

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