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view
박병욱_벽, 그리고 향
Review
대구국제아트페어
Review
옥정호_메이데이
Review
2023 섬진강국제실험예술제
Review
2023 프로젝트 제주: 이주하는 인간 - 호모 미그라티오
Review
건축, 미술이 되다
Review
데이비드 살레_World Peopl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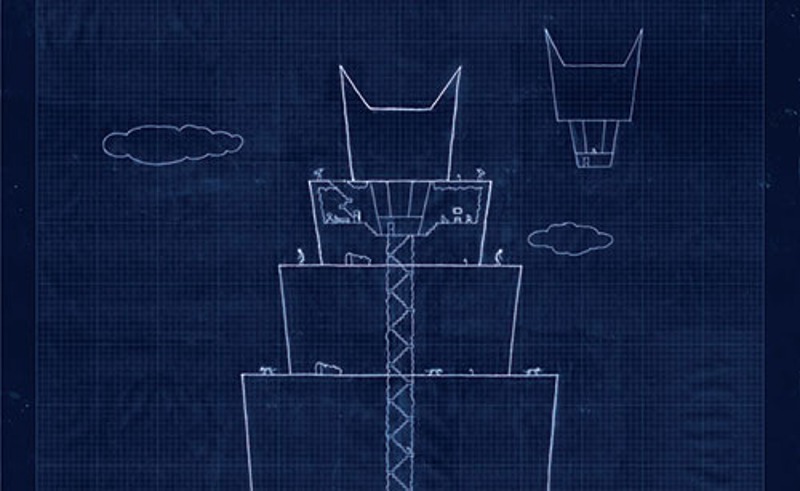
Review
김범_바위가 되는 법
Review
조유경, 최고래 I know this is cheesy…but…I want to be with you
Review
이병호_PIECE
Review
Hey Siri, How's the Weather Today?
Review
이민선_Sculpture
Review
영원, 낭만, 꽃
Review
외연과 심연
Review
언메이크랩_인기생물
Review
디 오리진: 아이작
Review
김태호_말 없는 말이 하는 말
Review
이은선_Where, 여기
Review
포ː룸 - 또 다른 시간을 위한 會 & 인간적인 것의 미로
Review
또 다른 얼굴들: 한국과 아세안의 가면
Review
윤진섭_아카이브
Review
이진휴_낯선 풍경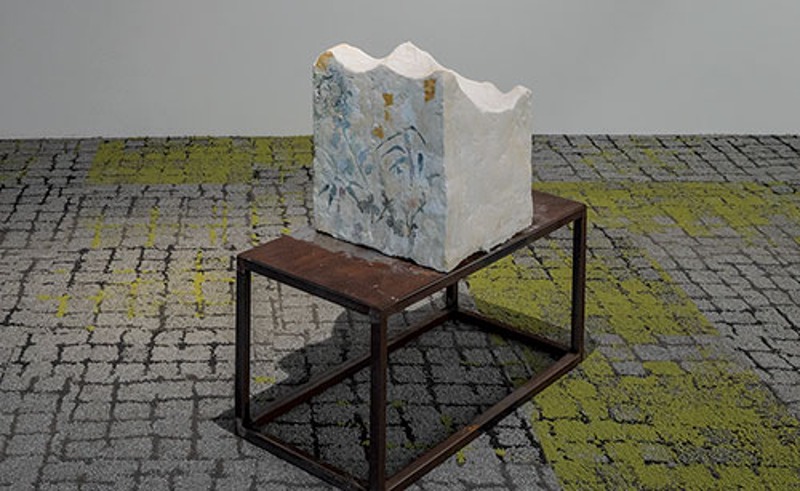
Review
고고학: Today was Today
Review
게임사회
Review
제14회 광주비엔날레: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
Review
로랑 그라소_아니마
Review
개척자들 박현기, 육태진, 김해민
Review
남진우 몬스터즈
Review
180도 달라진, 360도 달라진 절묘한 삼각관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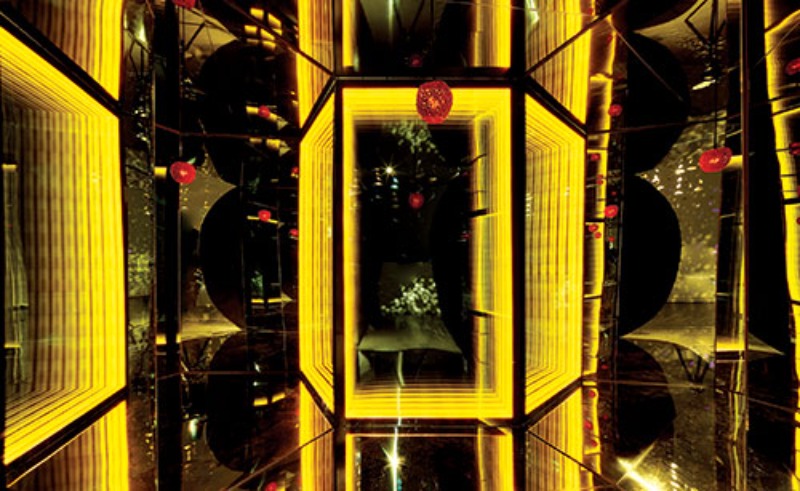
Review
심영철_춤추는 정원
Review
박선민_메아리와 서리의 도서관
Review
팬텀센스
Review
윤종주_시간이 색을 지닐때
Review
2023 SMA 공간연구: 사이의 리듬들
Review
방정아_욕망의 거친 물결
Review
곽남신_시시비비 비시시 是是非非非是是
Review
신정균_라스트 오브 어스
Review
끝에서 두 번째 세계
Review
최선아, 장순원_TORQUE3 - HIGH BEAM
Review
제12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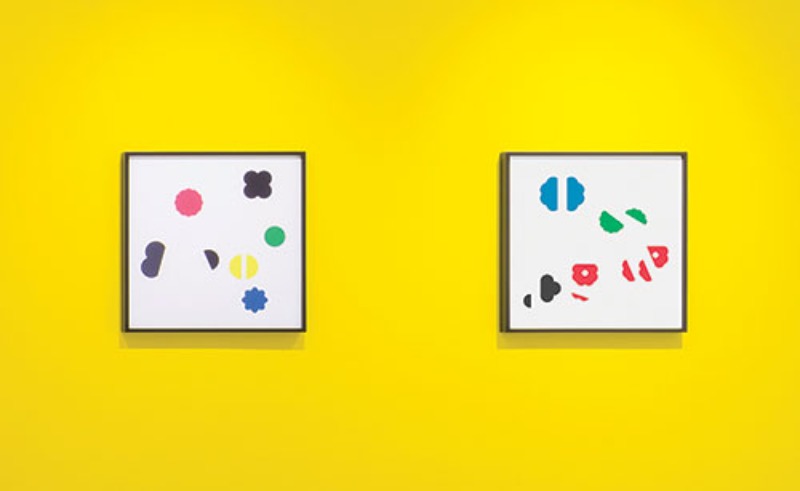
Review
홍승혜 복선伏線을 넘어서 II
Review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좀비
Review
비타 노바 새로운 삶
Review
2022 청년작가 초대전 김설아_숱한 산들이 흩어질 때
Review
대체불가현실 □☞∴∂★∽콜렉티브
Review
정철규_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Review
ɔ ː n
Review
조선희_姬: 나의 우주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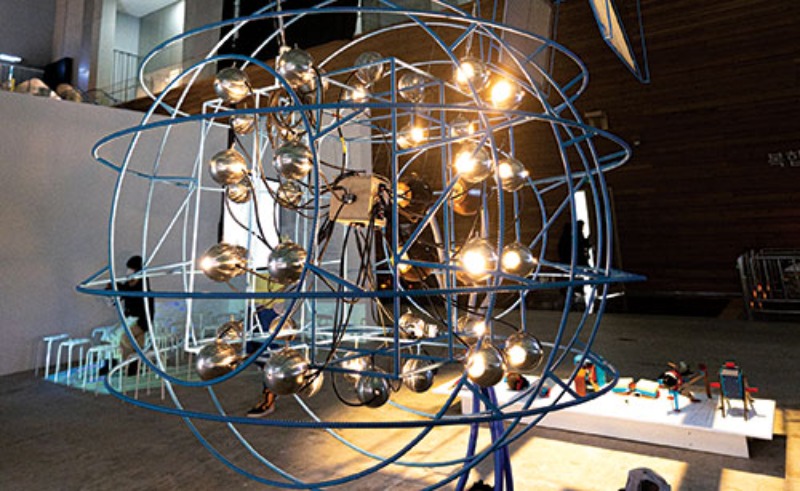
Review
지구 생존 가이드_포스트 휴먼 2022
Review
박민준_X
Review
요나스 메카스+백남준_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Review
황란_Becoming Again
Review
김복진과 한국 근현대 조각가들
Review
원초적 비디오 본색
Review
백남준 효과
Review
202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Review
일시적 개입
Review
2022 청년미술프로젝트: 경계점
Review
이기봉_Where You Stand
Review
반디산책: 지구와 화해하는 발걸음
Review
구름산책자
Review
자매들, 우리는 커진다: 서울-샌프란시스코 교류전
Review
우연을 기대
Review
신민_semi: 世美
Review
곽인탄_팔레트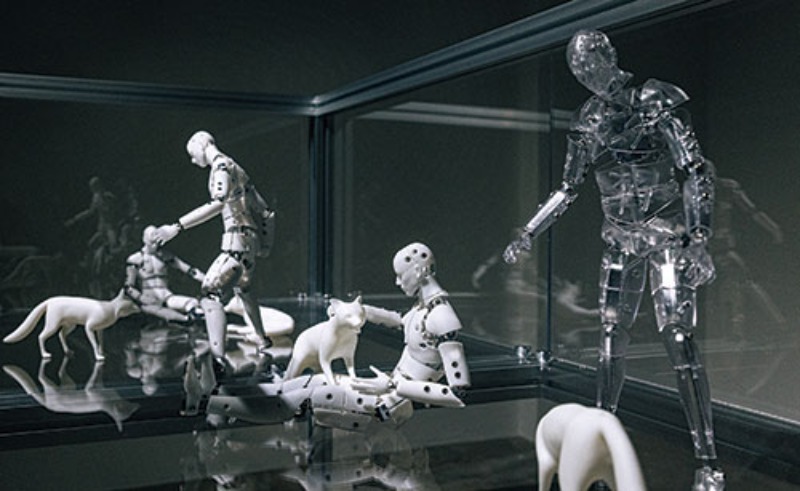
Review
장진승_L·A·P·S·E
Review
류호열_IMAGINATION
Review
윤향로_태깅
Review
이건용_Reborn
Review
우리, 할머니
Review
키아프 서울
Review
2022 12H-Internet Live Performance ‘Good Morning Artist’
Review
땅속 그물 이야기
Review
2022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미술의 공진화
Review
이희준_Heejoon Lee
Review
아트제주 2022: 팝업
Review
한국의 채색화 특별전: 생의 찬미
Review
김지아나_CONATUS
Review
대전과학예술비엔날레 2022: 미래도시
Review
전나환_Paper and Canvas
Review
최태훈_우드타입
Review
황영자_돈키호테
Review
히토 슈타이얼_데이터의 바다
Review
두 번째 봄
Review
민성홍_보임의 보임
Review
심승욱_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익숙함
Review
장마리아 Iridescent
Review
페이지 너머
Review
아이 엠 그라운드
Review
이민선, 이신애 롱디의 맛
Review
안창홍-유령패션
Review
제11회 부산국제화랑아트페어
Review
차와 커피의 시간
Review
이안 쳉_세계건설
Review
2022 화랑미술제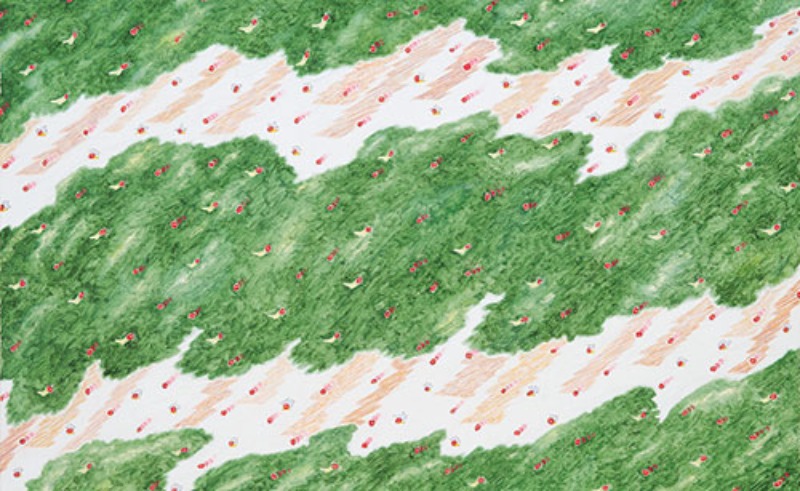
Review
고니_노란 카나리아
Review
태양에서 떠나올 때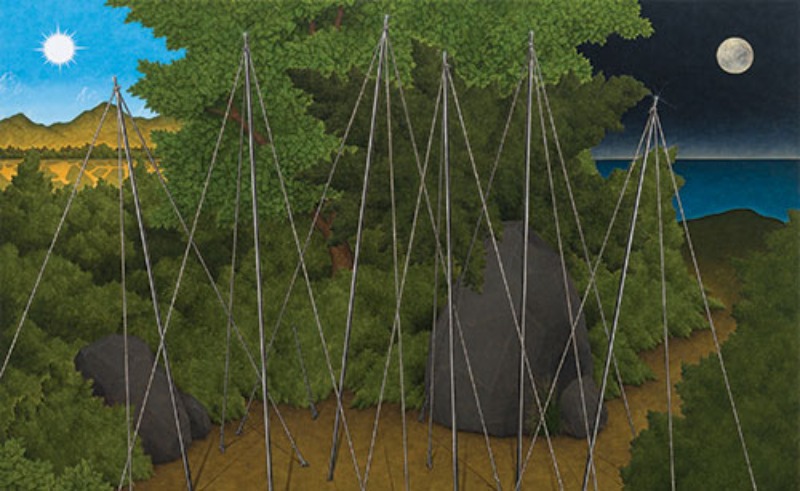
Review
이재석_밴티지 포인트
Review
이상용 초대전
Review
대지의 시간
Review
미래의 역사 쓰기: ZKM 베스트 컬렉션
Review
모던 라이프
Review
집합 이론
Review
최호철_보步보步시是걸음걸음마다 보는 풍경
Review
유화수잡초의 자리
Review
사랑은 타이밍이다
Review
태싯그룹인비트윈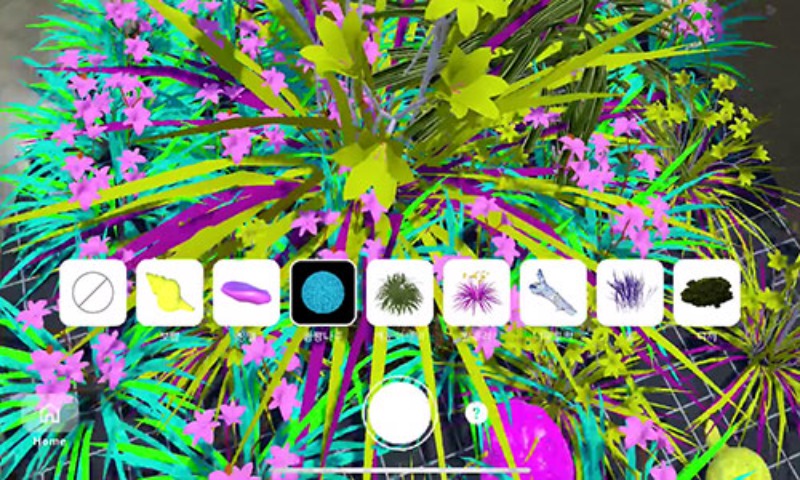
Review
산지천,복개를 걷어내고
Review
네오 라우흐, 로사 로이 경계에 핀 꽃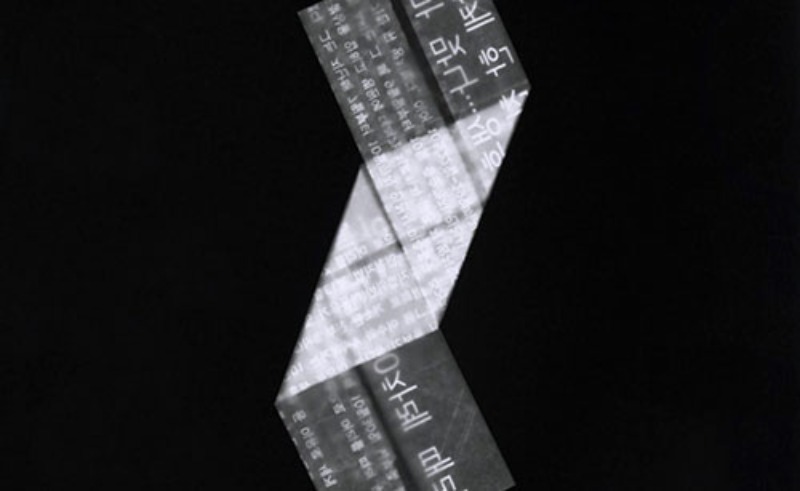
Review
넥스트코드 2021
Review
이지연: Stain-Rainbow Forest
Review
광대하고 느리게: 권혜원, 박은태, 조은지
Review
논캡션 인터뷰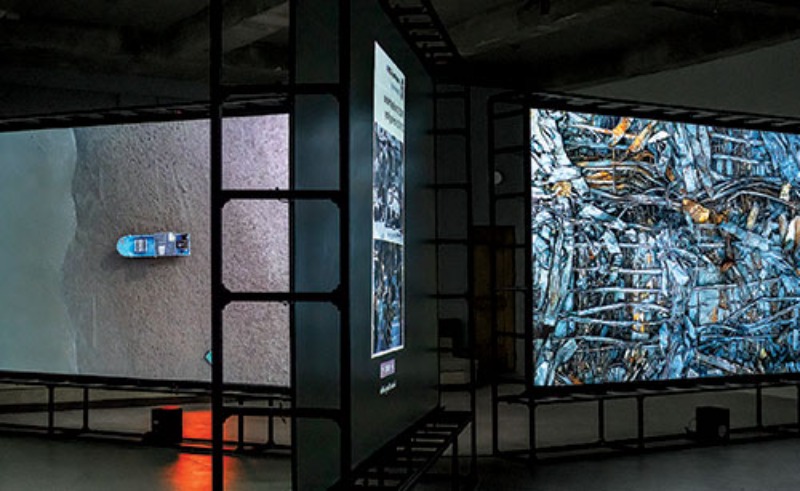
Review
이정우: 승선하지 않았다
Review
빌리 장게와: 혈육
Review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4.4
Review
인간, 일곱 개의 질문
Review
이원호_오만가지
Review
박찬욱_너의 표정
Review
FOMO(Fear of Missing Out)
Review
횡단하는 물질의 세계
Review
2021 대구아트페어 올댓큐레이팅×아트경기
Review
송필_Beyond the Withered
Review
AES+F. 길잃은 혼종, 시대를 갈다
Review
변*태_시대를 탐하다 비끗하다
Review
KIAF SEOUL 2021
Review
최원준_하이라이프
Review
하-하-하 하우스
Review
몸이 선언이 될 때
Review
감각정원: 밤이 내리면, 빛이 오르고
Review
이광호_안티프래질
Review
김희수 NORMAL LIFE: Be Normal and People
Review
오연진, 허요 2인전 물질의 구름
Review
이혁발 몰랑몰랑 육감도
Review
현남_무지개의 밑동에 굴을 파다
Review
설탕과 소금
Review
김남두_허구와 실재의 공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