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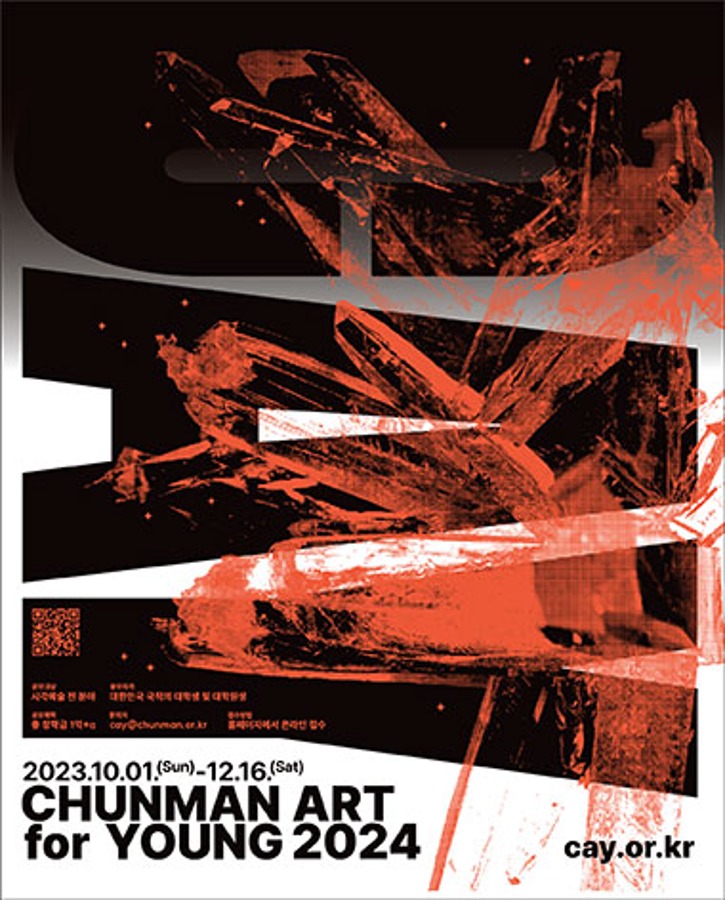
Key Work
제2회 ChunMan Art for Young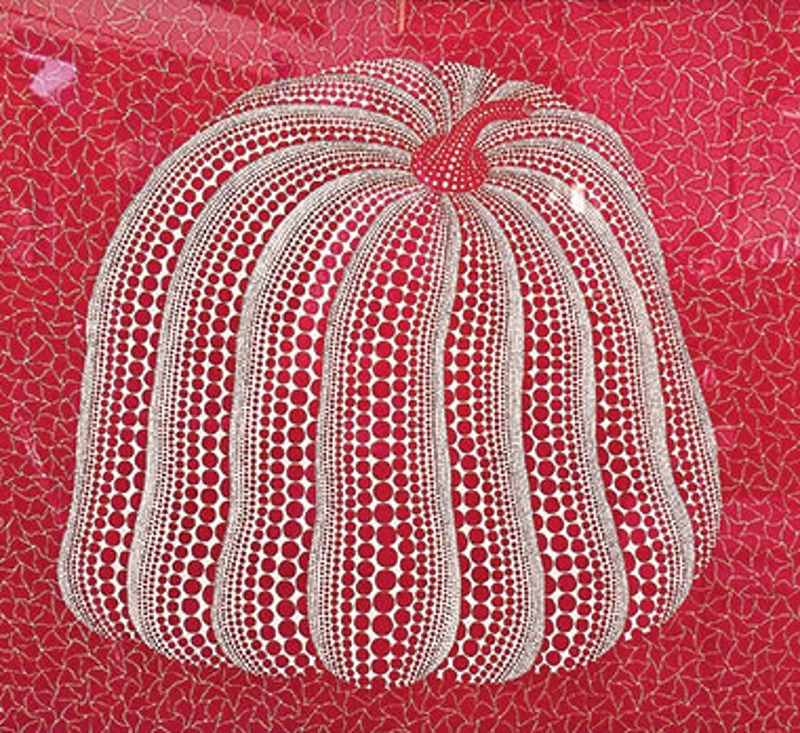
Key Work
아트광주23
Key Work
트위드 드 샤넬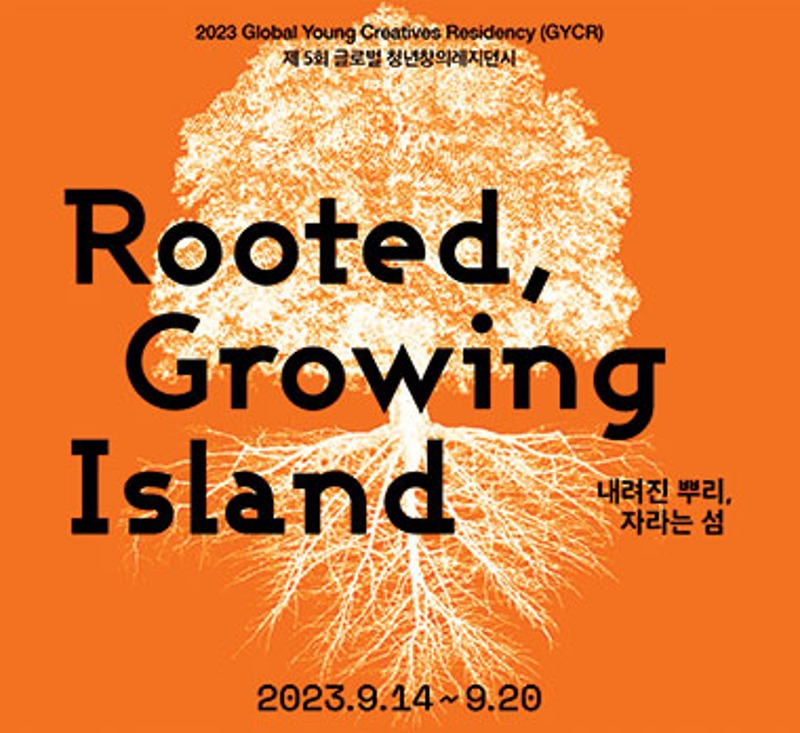
Key Work
2023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내려진 뿌리, 자라는 섬’
Key Work
2023 서울거리예술축제
Key Work
하늬풍경
Key Wor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과기술융합지원’사업
Key Work
Dreams of Urban
Key Work
아트픽 30
Key Work
Discovery: 12 Contemporary Artists from Korea
Key Work
멤피스
Key Work
크래시
Key Work
한국마사회 말박물관 초대 작가 이은경 전시_The PATH
Key Work
프리다
Key Work
작가 이매리 개인전_Homeostasis 그리스 크레타 국립현대미술관서 열려
Key Work
나주시 국제 레지던스 오픈 스튜디오 개최
Key Work
시대를 품다, 광주 현대미술
Key Work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주제 발표 ‘판소리 - 21세기 사운드스케이프’로 공간 탐구
Key Work
‘2024 부산비엔날레’ 전시감독 필립 피로트, 베라 메이 선정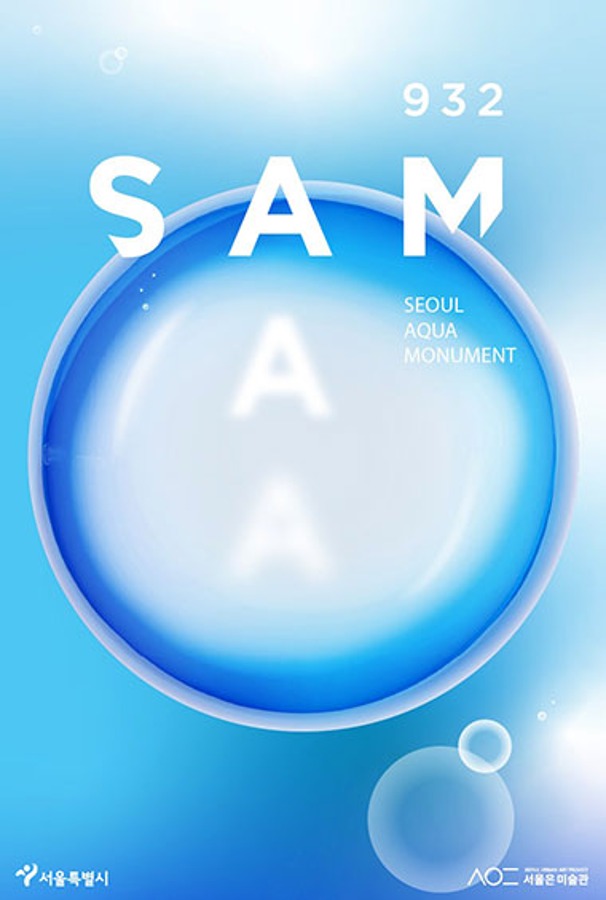
Key Work
서울은 미술관
Key Work
보이드: 무의식의 사유
Key Work
오프-타임
Key Work
타임 언리미티드
Key Work
어반브레이크 2023
Key Work
정광훈 개인전 6월 6일까지 순천문화예술회관서 개최
Key Work
고려대학교 박물관 현대미술전시실 개관 50주년 기념 특별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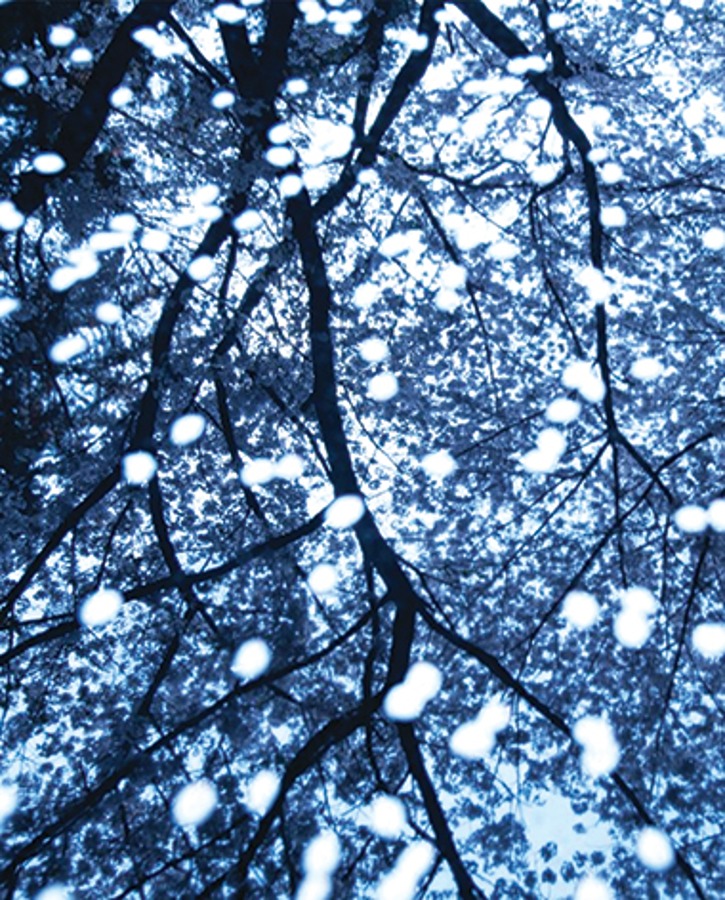
Key Work
박상원 사진전 미국 LA서 개최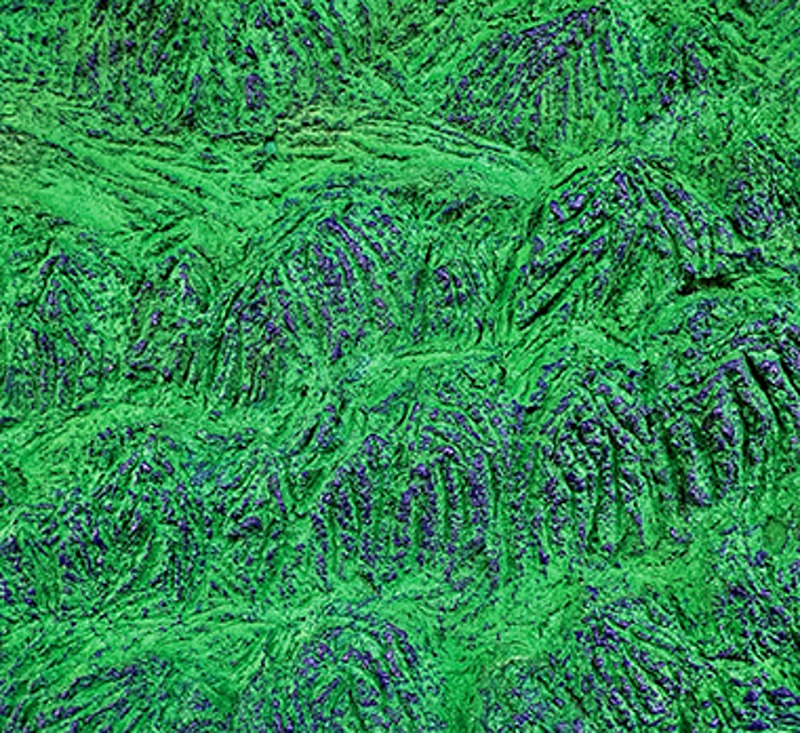
Key Work
나만의 풍경
Key Work
이명미_사막을 건너는 법
Key Work
제24회 단원미술제
Key Work
몫·숨
Key Work
프로젝트 팀 펄 전시
Key Work
울산시립미술관 소장 결과보고
Key Work
MADE IN CHANGWON: M623GNN392
Key Work
기록과 예술이 함께하는 서울시립 미술아카이브 개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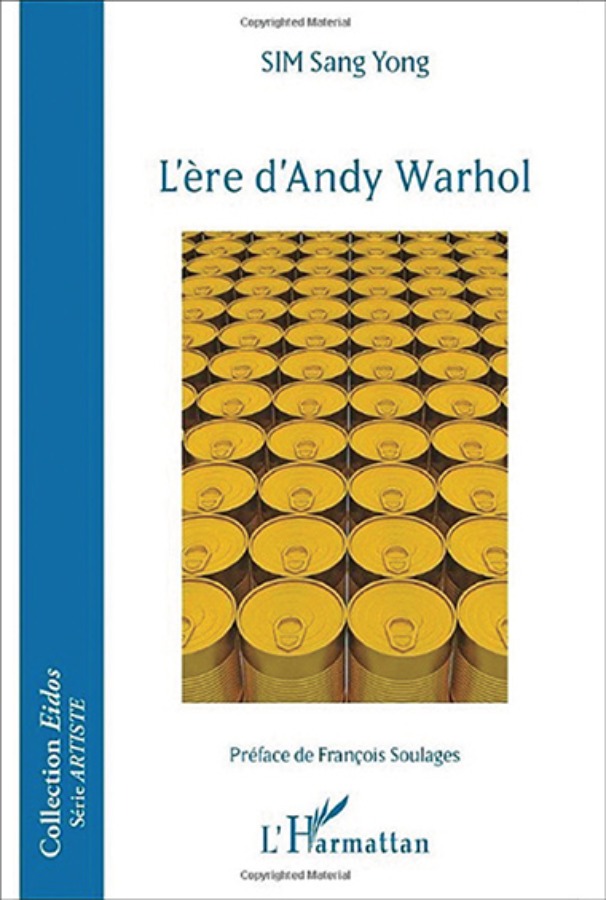
Key Work
『앤디 워홀의 시대(L’ère d’Andy Warhol)』
Key Work
정유미 개인전
Key Work
아홉, 이야기
Key Work
다양성과 확장성의 미술축제 ‘더프리뷰성수’
Key Work
라흐마니노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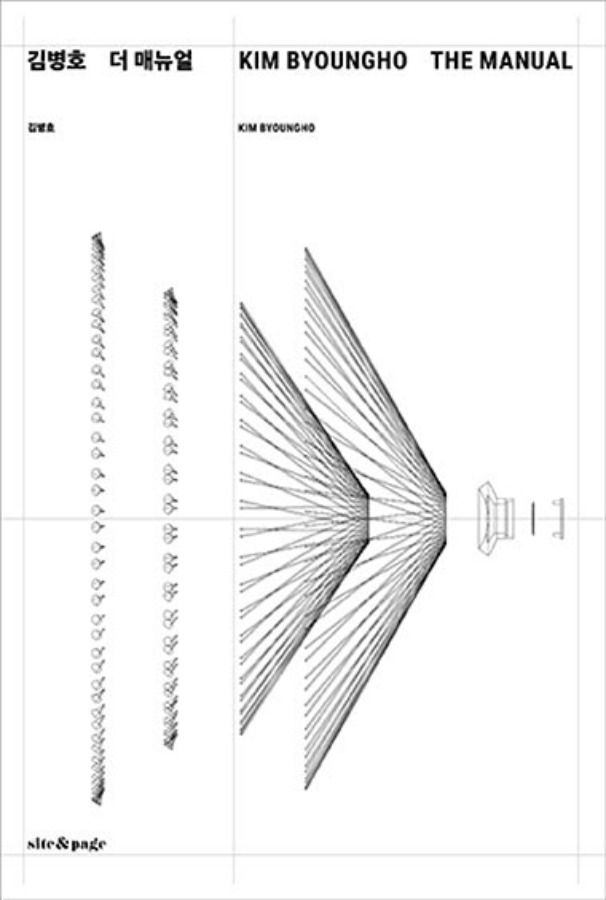
Key Work
『김병호: 더 매뉴얼』
Key Work
2023년 국공립미술관 협력사업 이응노 탄생 120주년 기념 특별전 & 국제학술대회
Key Work
‘제20회 에르메스 재단 미술상’ 작가 김희천 최종 수상
Key Work
데이비드 호크니 & 브리티시 팝 아트
Key Work
미술은행·정부미술은행 작품구입 공모 4월 14일까지 접수
Key Work
파우스트
Key Work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학술세미나
Key Work
『그림 감상도 공부가 필요합니다』
Key Work
사진이 걸린 방
Key Work
아무것도 아닌 듯… 성능경의 예술 행각
Key Work
삼성문화재단·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 의사 문화유산 보존·복원 MOU 체결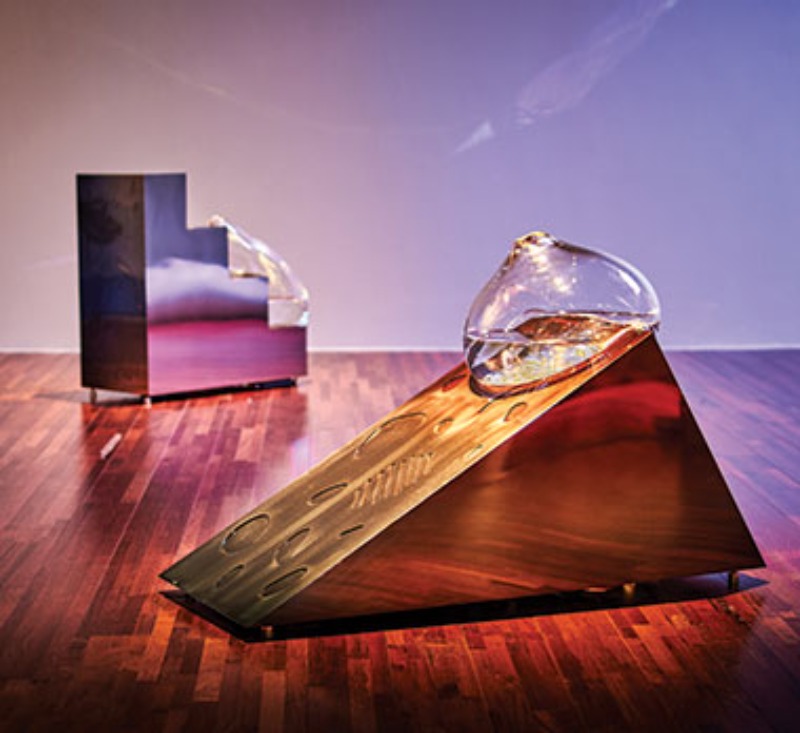
Key Work
‘수림미술상 2023’ 3월 19일까지 공모 접수
Key Work
설치미술가 민성홍 2023 ‘박동준상’ 수상
Key Work
'제17회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공모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
Key Work
박상원 특별초대전 1월 30일까지 비율갤러리서 열려
Key Work
오래된 미래
Key Work
‘2023 ACC 지역작가 공모’ 2월 20일부터 3월 6일까지 접수
Key Work
『한국 미술 다시 보기 1-3』
Key Work
‘2023청주국제공예공모전’ 3월 31일부터 5월 7일까지 접수
Key Work
예술과 세상의 관계탐구 ‘제3회 제주비엔날레’ 참여작가 리크릿 티라바닛(Rirkrit Tiravanija)
Key Work
『ㄷ떨』1호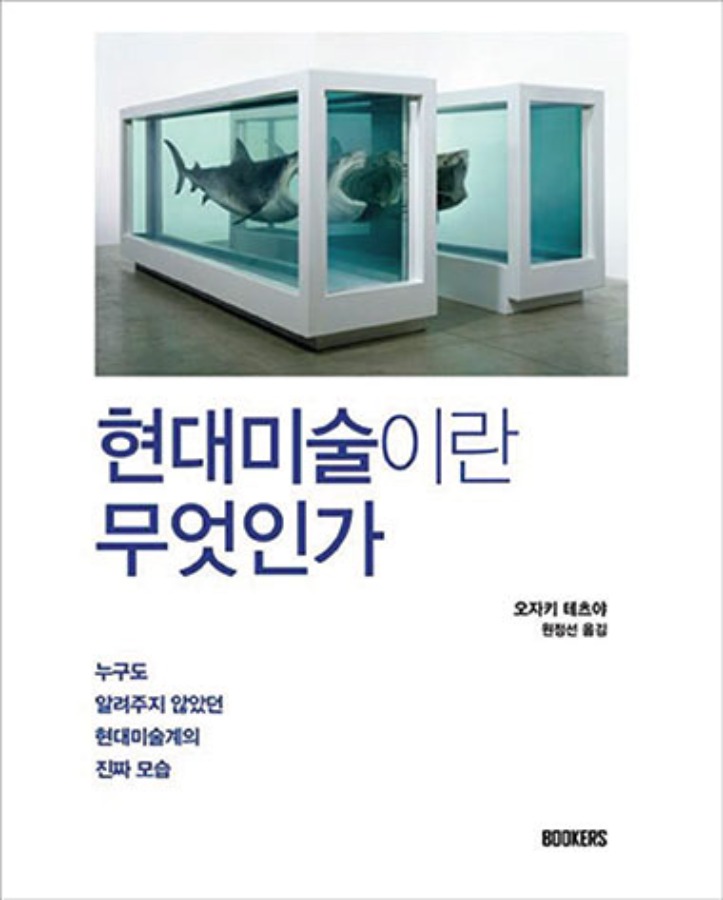
Key Work
현대미술이란 무엇인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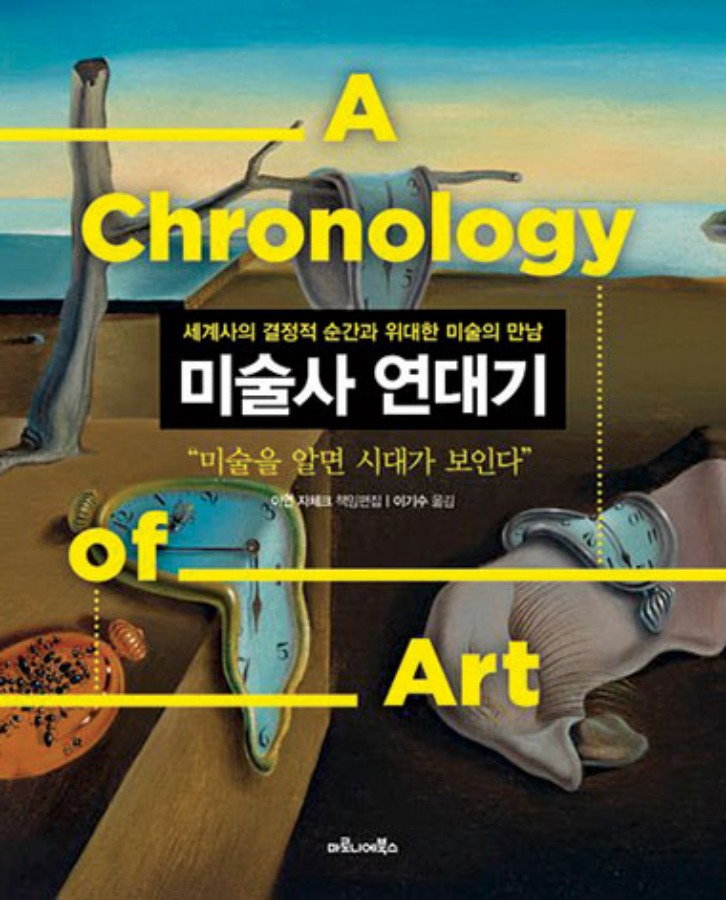
Key Work
미술사 연대기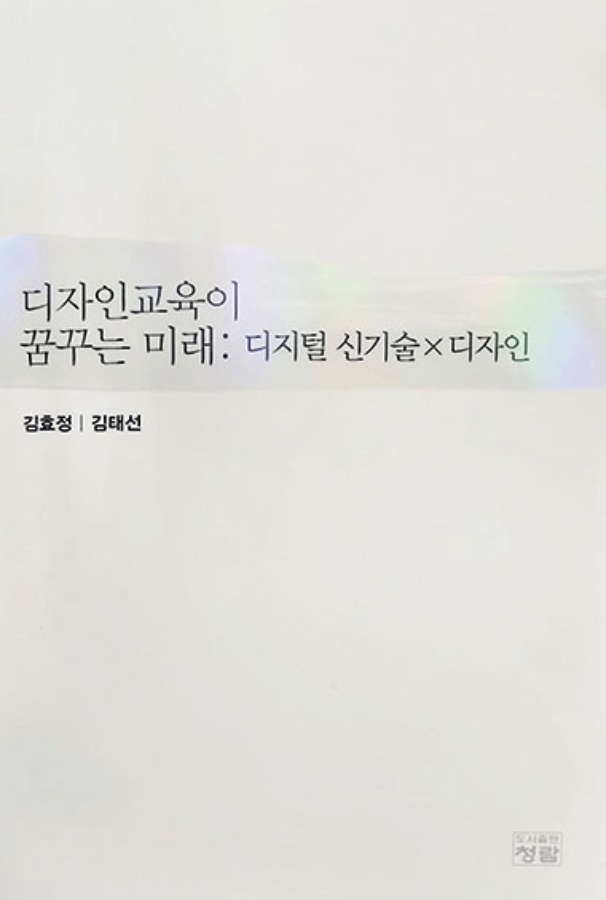
Key Work
디자인교육이 꿈꾸는 미래: 디지털 신기술×디자인
Key Work
소행성, 이면의 순간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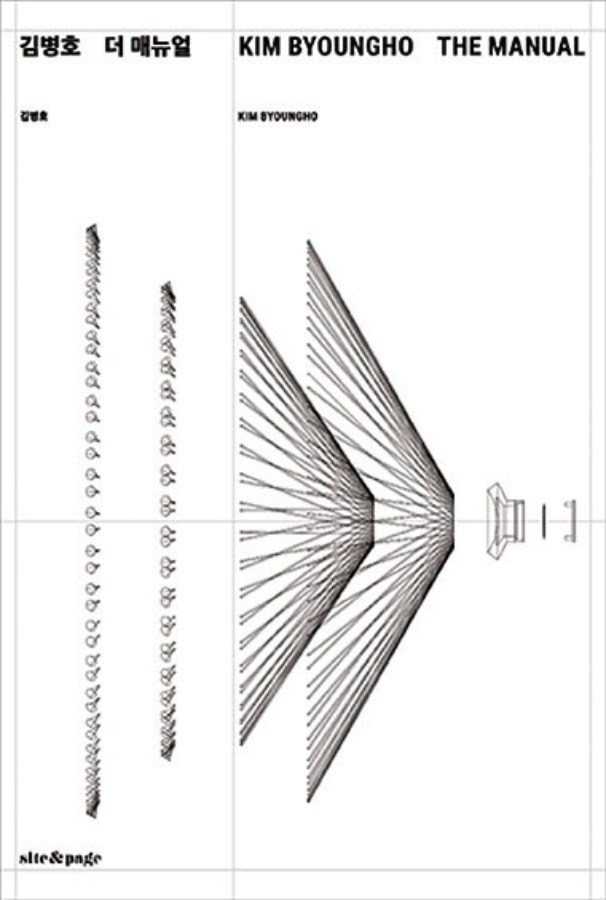
Key Work
김병호: 더 매뉴얼
Key Work
2023-2025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사업
Key Work
땅, 호흡, 소리의 교란자: 포스트콜로니얼 미학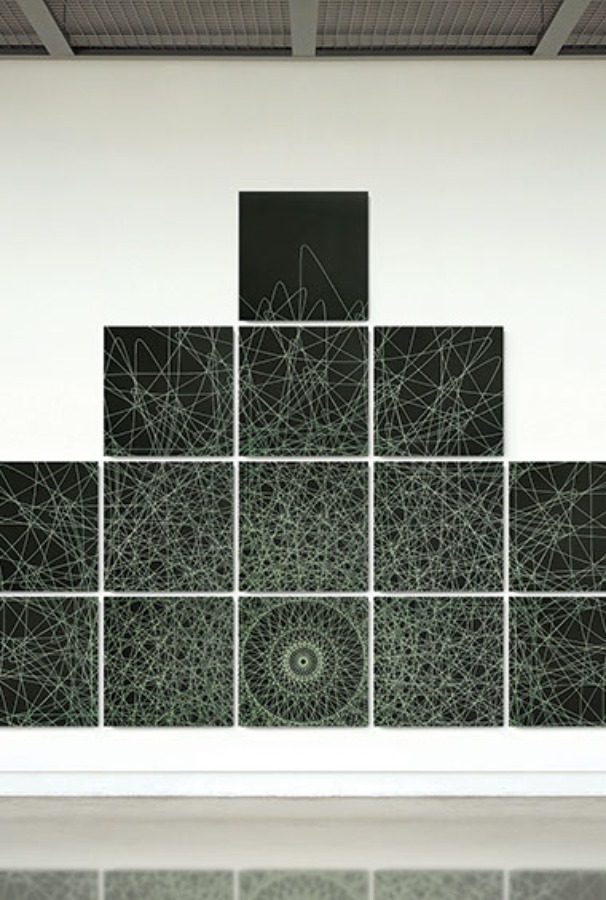
Key Work
넥스트코드 2023
Key Work
한국문화예술위원회_아르코 공공예술 사업
Key Work
김영삼 & 허회태: 붓질의 콜라보
Key Work
꿈 Metamorphosis
Key Work
양승욱_유랑극단
Key Work
서울융합예술페스티벌 언폴드엑스 2022
Key Work
불꽃, 더 큰 빛이 되다
Key Work
그림자의 그림자
Key Work
2022 탱크예술제
Key Work
뫼비우스적 노마드
Key Work
선셋+필드셋
Key Work
최재은 ‘에르메스, 판교를 건너다’ 에르메스 윈도에 선보여
Key Work
잡지주간 2022
Key Work
2022 우수 화랑 기획전시 ‘예비 전속작가제 지원’ 일환
Key Work
아트광주22
Key Work
계간 『문화/과학』 111호 ‘SF 사회’ 발간
Key Work
덧칠-4人4色 우리 삶에 스민 작품
Key Work
인도네시아 작가 루카스 실라버스 개인전 갤러리단정서 선봬
Key Work
‘2022 KAMA 컨퍼런스’ 아트컬렉팅과 비즈니스 주제로 성료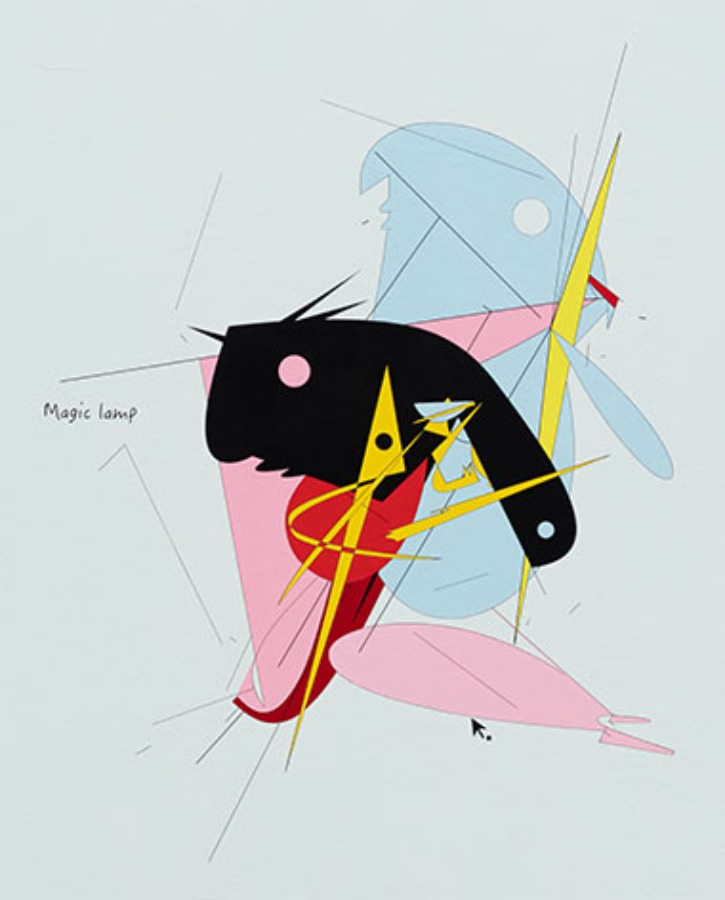
Key Work
매직 램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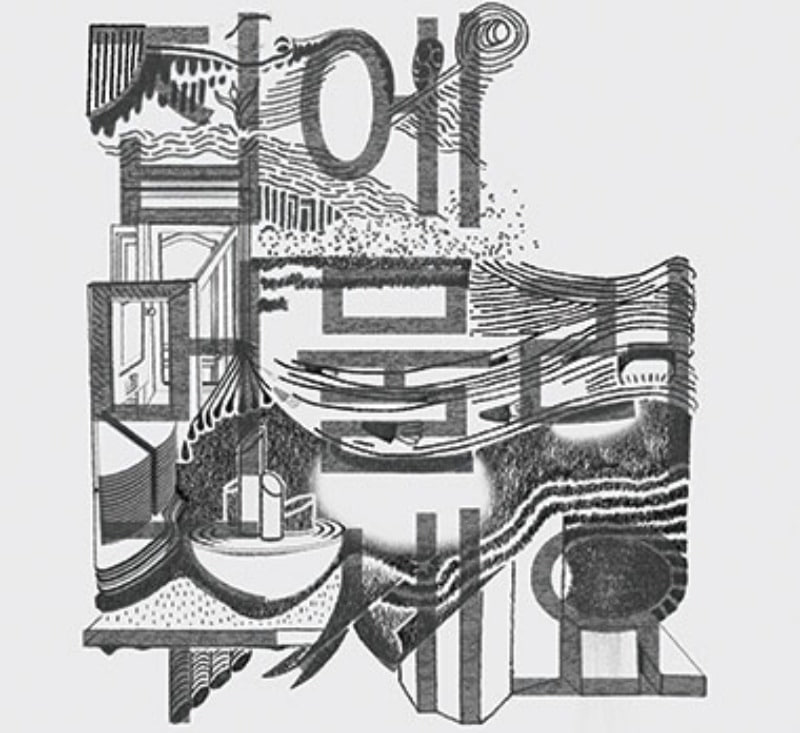
Key Work
뉴지엄(NUSEUM)
Key Work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23년 문예진흥기금 공모 접수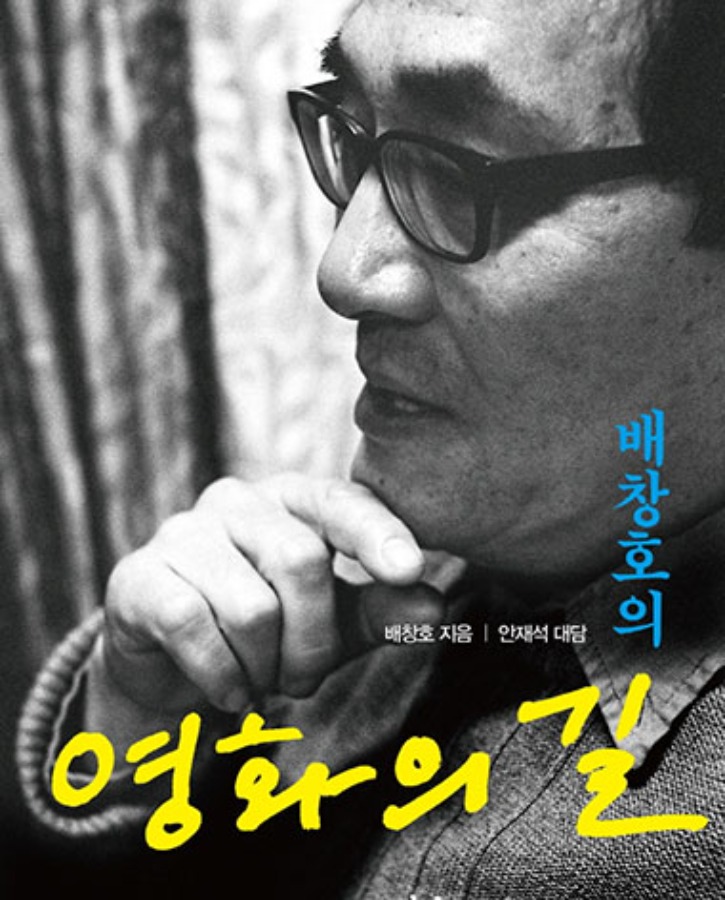
Key Work
배창호의 영화의 길
Key Work
샤넬 코리아ב프리즈’ 한국 예술가 조명하는 ‘나우 & 넥스트’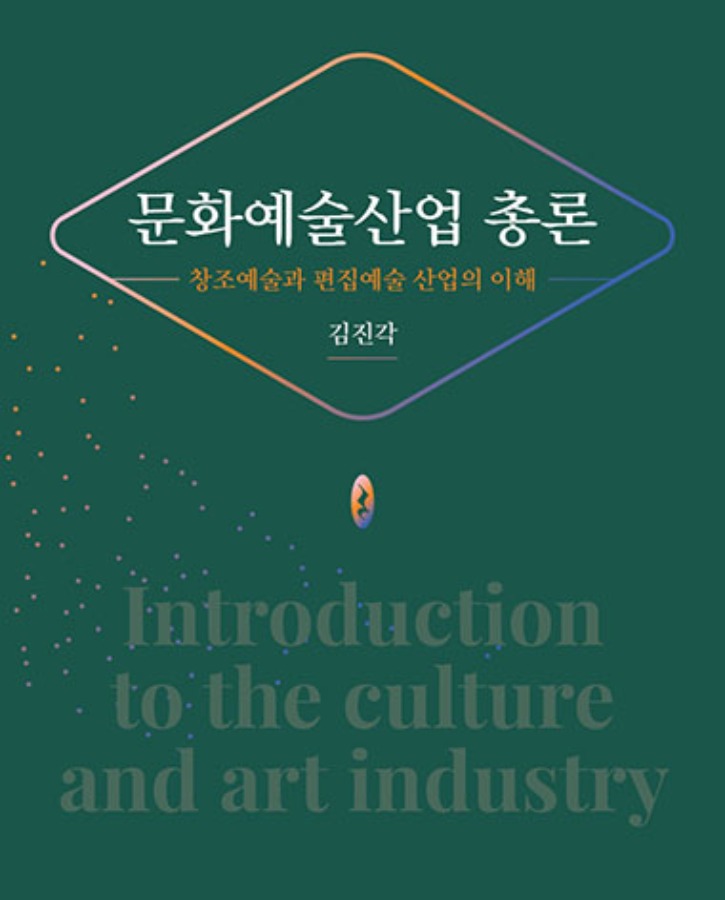
Key Work
문화예술산업총론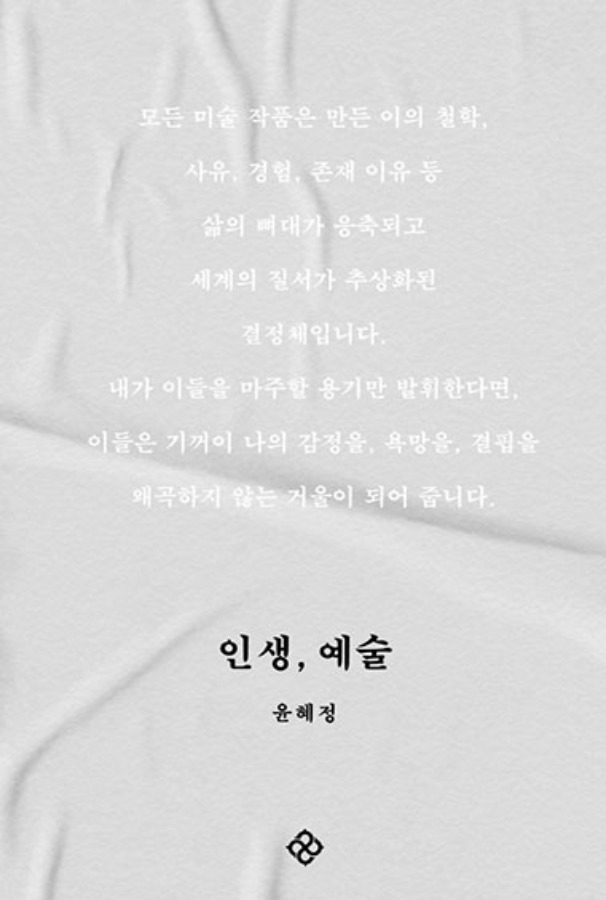
Key Work
인생, 예술
Key Work
배수영 개인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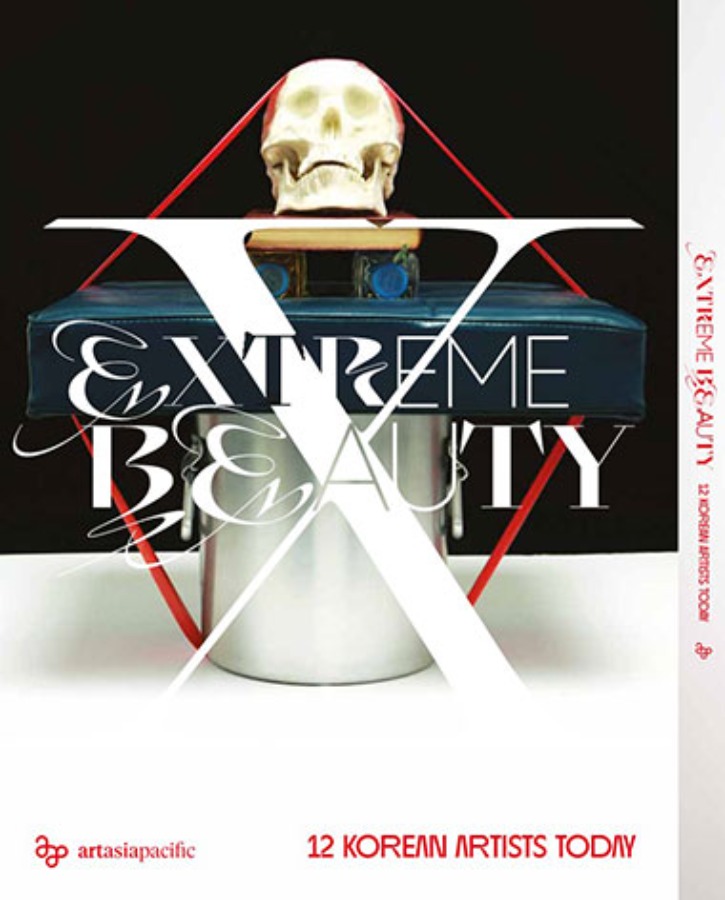
Key Work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 작가 알리는 삼박자 프로모션 진행
Key Work
티나킴 갤러리 기획전시 & 송원아트센터서 9월 15일까지 개최
Key Work
2022 한강조각프로젝트: 낙락유람
Key Work
양혜규 홍콩 M+ 소장품 된다
Key Work
선인장이 자라는 박물관
Key Work
제7회 서리풀 Art for Art 대상전
Key Work
CICA 2023 하반기 현대미술 작가 개인전 시리즈
Key Work
권진규 탄생 100주년 기념전
Key Work
레몬꽃닭날개
Key Work
청와대, 문화예술 랜드마크로 조성
Key Work
'더 스트림: 스크니링/토크_#33 임영주' 신촌극장서 진행
Key Work
'더 스트림: 스크니링/토크_#33 임영주' 신촌극장서 진행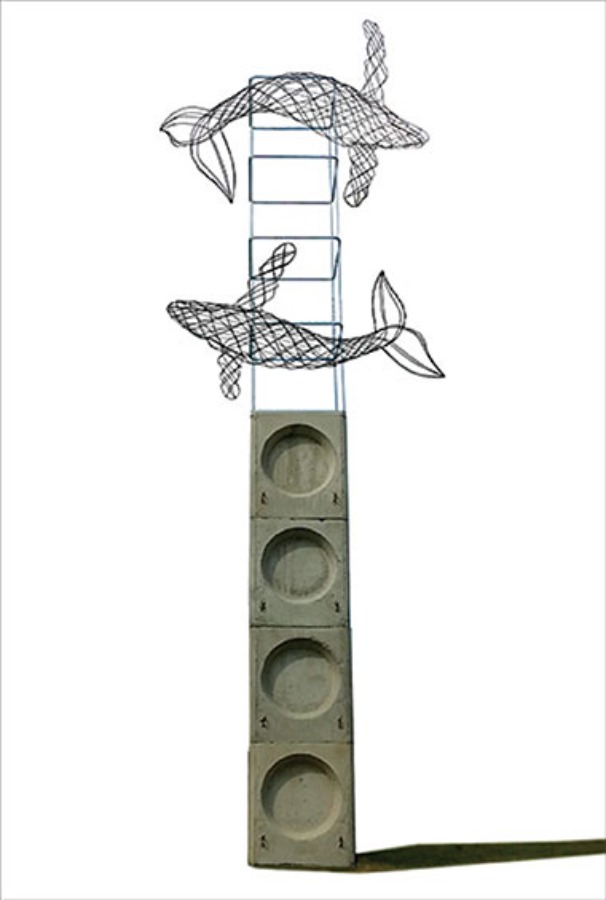
Key Work
제25회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Key Work
아트 오브 도플갱어 윤진섭
Key Work
포토 랭귀지
Key Work
작가 이승준 개인전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작은물서 선보여
Key Work
그림, 그 사람
Key Work
불꽃으로 살다
Key Work
5명의 여성 작가 전시 스페이스 윌링앤딜링서 열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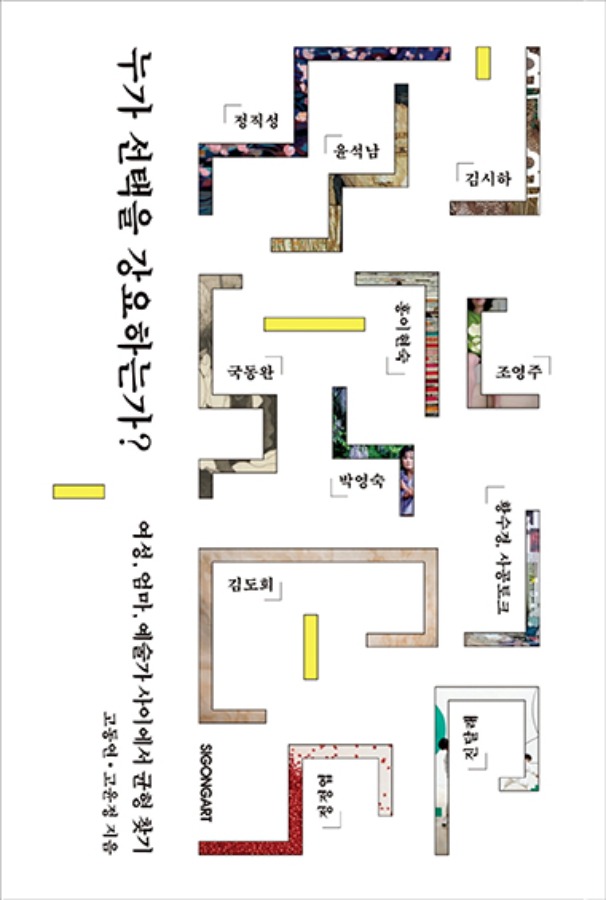
Key Work
누가 선택을 강요하는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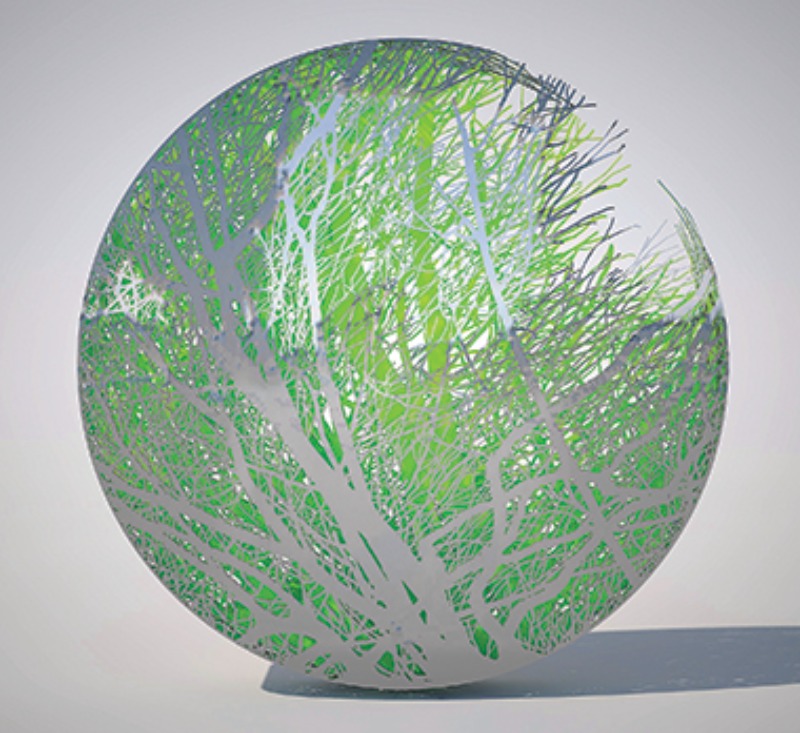
Key Work
미국 뉴욕 TYTART 작가 권치규 개인전 개최
Key Work
최혜숙 갤러리 스클로서 6월 18일까지 개최
Key Work
MMCA 과천프로젝트 2022: 옥상정원
Key Work
조각가 박은선 작품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에 영구설치
Key Work
페레스프로젝트 서울 개관전 개최
Key Work
멈출 새도 없이 이 말이 튀어나와 버렸지요
Key Work
더 프리퀄
Key Work
회오리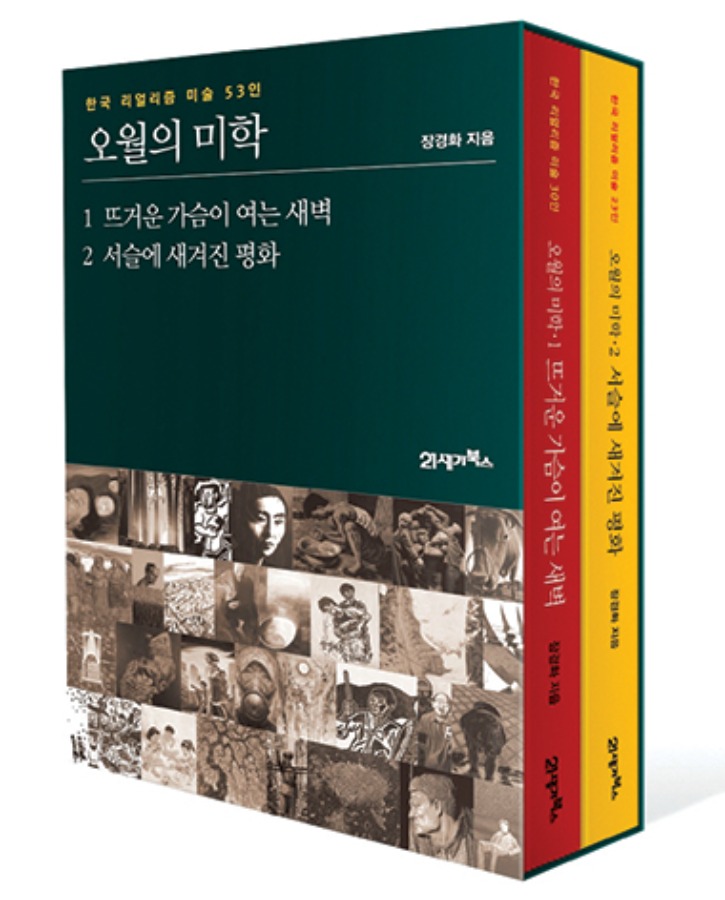
Key Work
오월의 미학
Key Work
영감의 원천 - 윤동주가 사랑한 한글
Key Work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_R 레지던시’ 2021 결과 발표전 개최 및 2022 모집 공고
Key Work
시칠리아 섬의 저녁기도
Key Work
국립현대미술관 ‘프로젝트 해시태그 2022’ 로스트에어, 크립톤 최종 선정
Key Work
‘지역, 시대. 세상을 연결하는 열린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비전 및 중점방향 발표
Key Work
이강소, 권순철 2인전
Key Work
‘제23회 단원미술제 선정작가 공모’ 6월 17일부터 26일까지 접수
Key Work
장서영 개인전 신도문화공간서 6월 12일까지 열려
Key Work
미술관에서 만나는 음악 ‘리움 멤버십 음악회’
Key Work
장파 개인전 4월 1일부터 28일까지 전시공간서 선봬
Key Work
5·18민주화운동 특별전 베니스서 11월 27일까지 전시
Key Work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지역작가 미디어아트 공모’ 실시
Key Work
예술과 객체
Key Work
예술의 정원
Key Work
엑스폼
Key Work
예술의 힘
Key Work
‘제3회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박남희 전시기획자 선정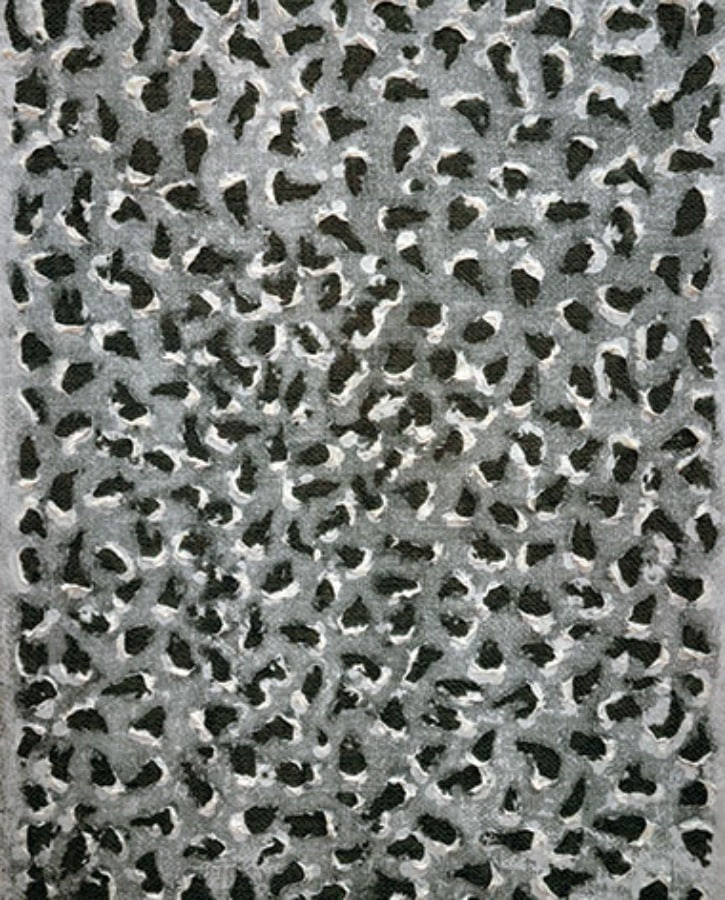
Key Work
작가 최만길의 개인전 나만의 풍경
Key Work
미술품 대여·전시 기획 단체 4월 18일까지 공모 접수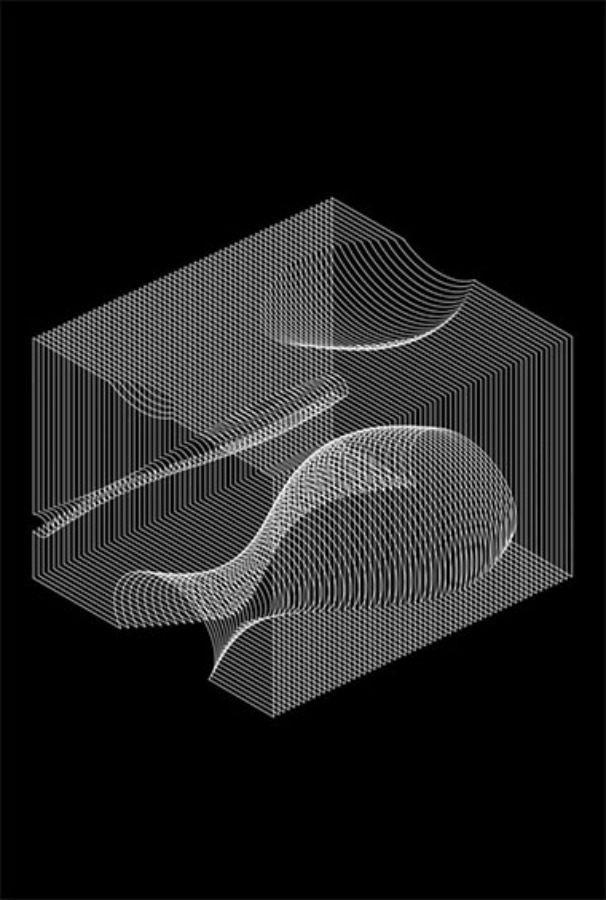
Key Work
NFT 디지털 아트 전문 갤러리 ‘마스그린’ 오픈
Key Work
담양뎐_기억의 시간
Key Work
백남준과 이어령의 지음지간(知音之間)을 꿈꾸며
Key Work
2022 미술은행 공모제 2022 정부미술은행 공모제 개최
Key Work
Art For Green 展, 공존을 향한 예술의 여정
Key Work
문화기획자들의 성장 플랫폼 ‘Unfold X 기획자학교’ 심화과정 선정 프로젝트 순차공개
Key Work
'제16회 퍼블릭아트 뉴히어로’ 공모 3월 2일부터 4월 2일까지 접수
Key Work
‘2022 제2회 반도 전시기획 공모전’ 5월 16일까지 서류 접수
Key Work
2022 제1회 통영국제트리엔날레
Key Work
사진으로 만나는『베를린, 기억의 예술관』
Key Work
Amulet-호령_범을 깨우다 展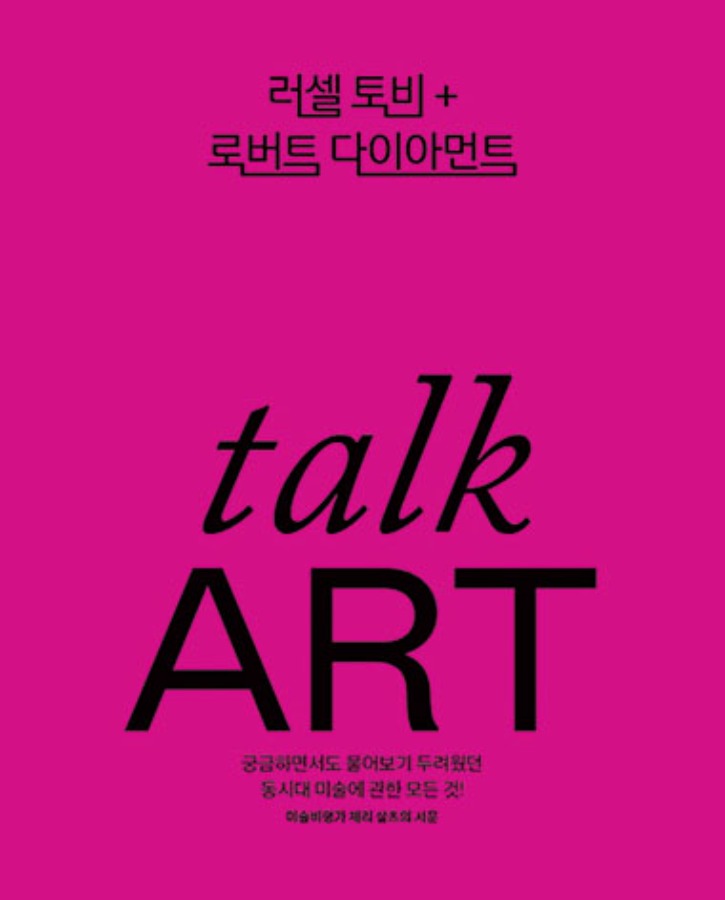
Key Work
토크 아트
Key Work
한 도시의 급진성 혹은 진정성
Key Work
리차드3세
Key Work
엑스칼리버
Key Work
제48회 사단법인 한국여류화가협회전
Key Work
Lucky Messenger
Key Work
그래서 널 먹겠어
Key Work
2022 아트플러그 연수 1기 입주작가 2월 13일까지 서류 접수
Key Work
2022 아르코 스크리닝 프로그램 ‘직면하는 이동성: 횡단/침투/정지하기’
Key Work
빛으로 수놓은 서울의 밤 ‘서울라이트’ 성료
Key Work
‘제21회 송은미술대상’ 대상 수상자 작가 권아람 선정
Key Work
2022 아르코 공공예술사업 공모 1월 21일까지 접수
Key Work
‘제14회 광주비엔날레’ 예술총감독에 이숙경 테이트모던 수석 큐레이터 선임
Key Work
‘2022 경기예술지원’ 공모 1월 14일까지 접수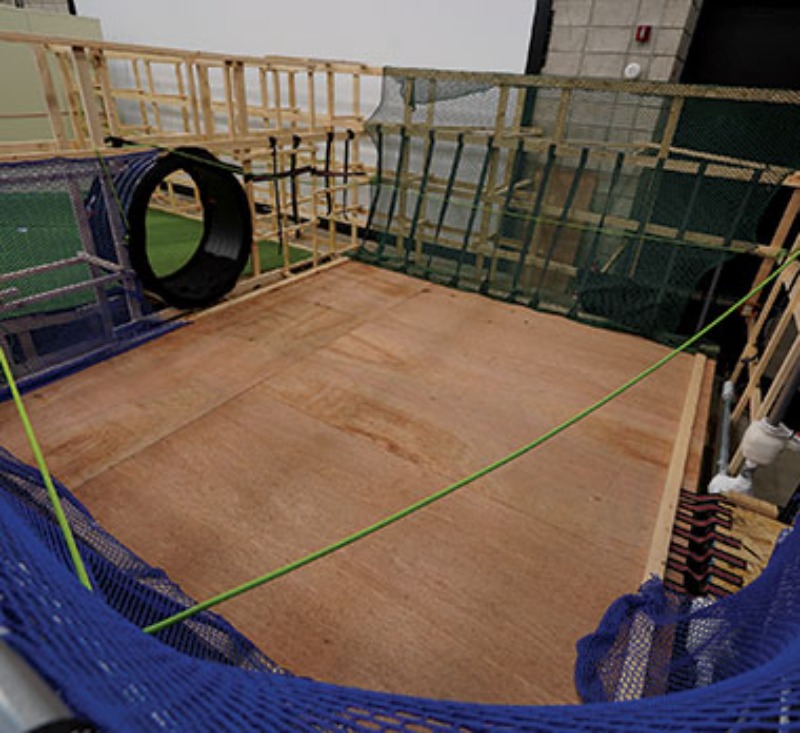
Key Work
홍이현숙_오소리 A씨의 초대
Key Work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컨퍼런스
Key Work
로랑 페쥬(Laurent Pejoux)에르메스 재단 디렉터 인터뷰
Key Work
Christmas Vibes_진동하는 빛과 물질
Key Work
2021 DMZ Art & Peace Platform_Borderless DMZ 정연심 예술총감독
Key Work
무위자연 - ‘세 개의 방’
Key Work
조각가 김경민 초대전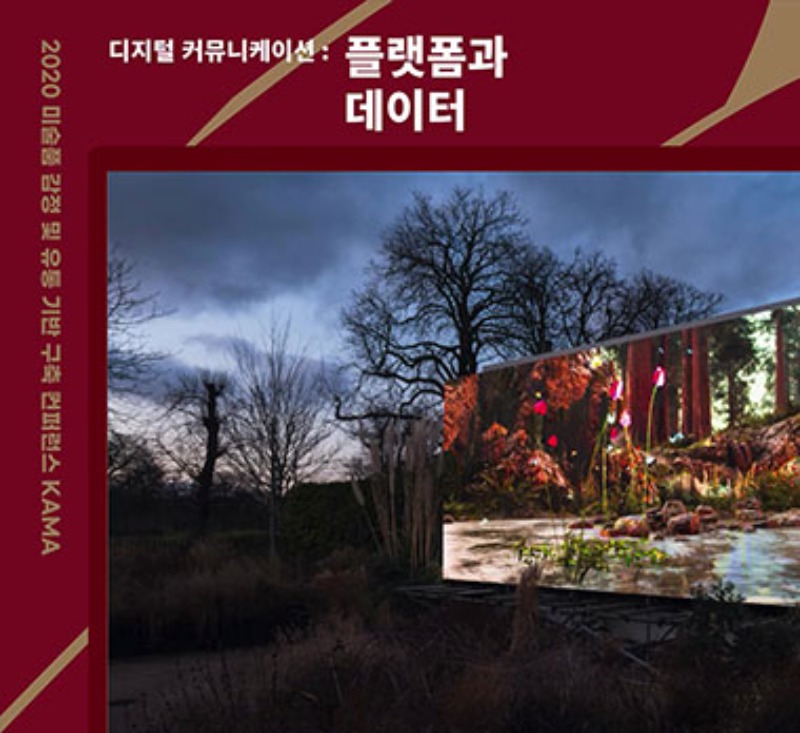
Key Work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컨퍼런스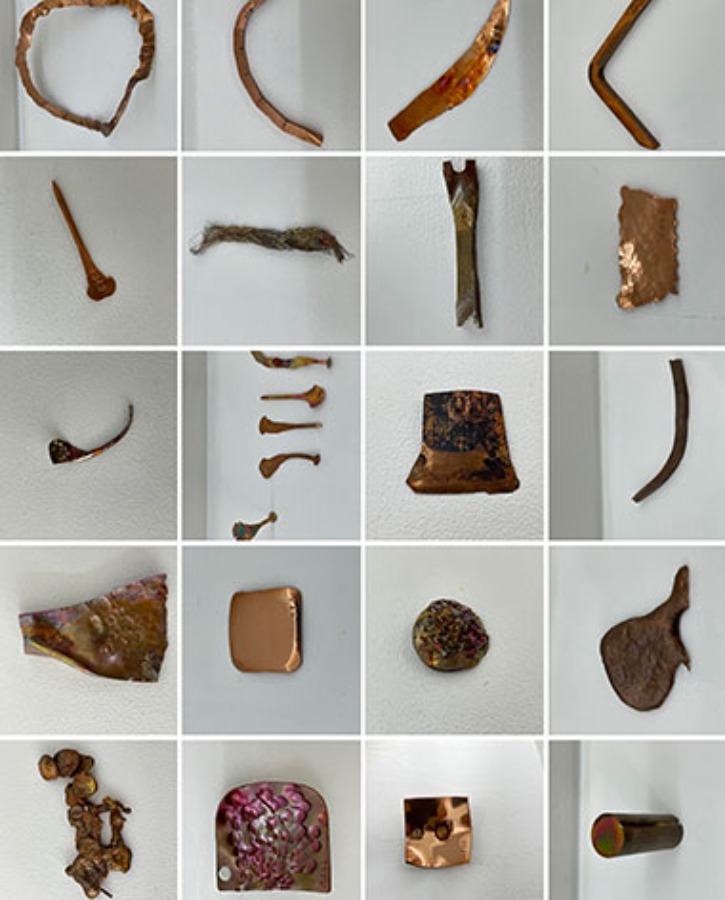
Key Work
비넥스트
Key Work
‘2022 서울예술지원’ 12월 10일까지 1차 공모 접수
Key Work
예술과 기술의 만남 융합예술플랫폼 ‘언폴드 엑스’ 성료
Key Work
APAP 돌아보고 나아가다
Key Work
김신욱 개인전
Key Work
‘제22회 단원미술제’ 단원미술대상 최종 수상에 박준형 작가
Key Work
미술품 유통·감정 인식 개선 캠페인 ‘작품의 가치, 신뢰를 같이’
Key Work
리그 오브 레전드 유니버스와 현대미술의 만남 애니메이션 ‘아케인’ 예술로 재탄생
Key Work
'행복한 미술시장’ ‘아트광주21’
Key Work
2021 코리아 리서치 펠로우:10×10 ‘나’와 ‘우리’사이
Key Work
제10회 서울국제조각페스타 2021
Key Work
잃어버린 동심으로의 여행 조르디 핀토의 예술 세계
Key Work
오픈미디어아트페스티벌 2021:디지털 아우라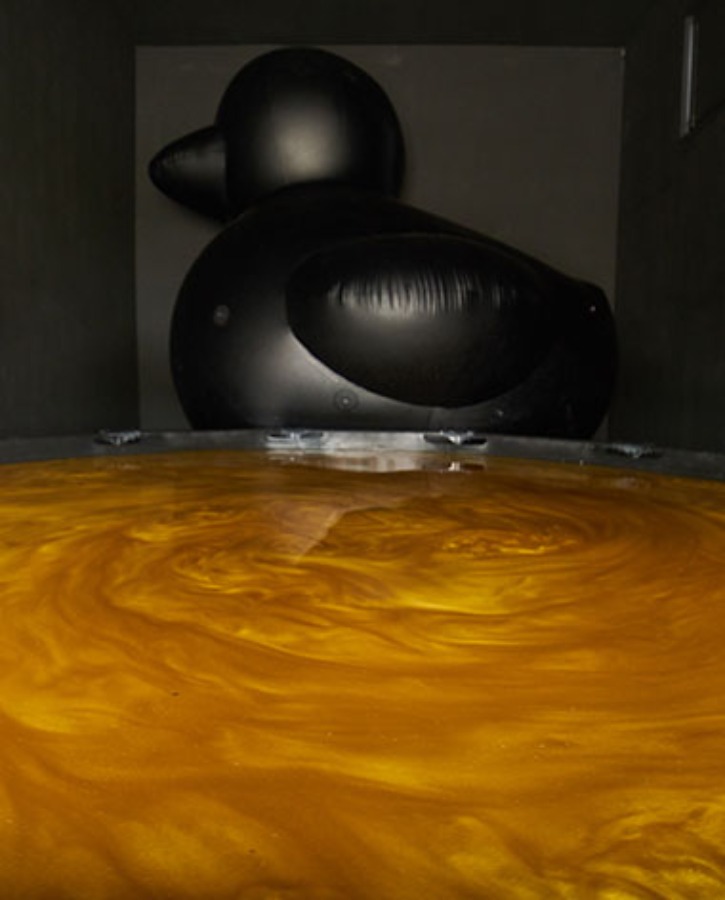
Key Work
‘2021 becoming a collector.: 부여아트페어’
Key Work
현대 블루 프라이즈 디자인 2022 참가자 모집 & 2021 수상자 전시
Key Work
조근호의 자연심상과 도시일상의 뭉치산수
Key Work
제17회 청유회 정기전
Key Work
‘제15회 태화강국제설치미술제’ 10월 14일부터 31일까지 펼쳐져
Key Work
같이, 우리
Key Work
제6회 서울은미술관 공공미술 컨퍼런스
Key Work
지킬앤하이드